|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는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약은 미국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 해외시장은 바이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젊은 우리가 한발 앞서 가자’는 패기로 도전했다. 시간이 지나 국내와 해외를 잇는 ‘최초의 바이오 가교’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14일 서울 강남구 서울도심공항에 있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년(사진·38) 전무와 이찬호(사진·36) 상무는 ‘글로벌바이오성장 제1호 PEF(사모투자조합)’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운용과 심사를 각각 맡는 두 사람이 국내 최초의 해외 바이오 벤처기업 투자 PEF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김 전무는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맥쿼리은행과 증권, 인터베스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재무 분야 전문가다. 이 상무는 성균관대 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아제약 연구원으로 일한 뒤 케임브리지 MBA를 졸업, 귀국 후 LIG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인터베스트 심사역으로 활약했다. 바이오 투자 업계에서는 금융과 바이오, 이종(異種)을 모두 섭렵한 몇 안 되는 인물로 유명하다.
최초의 해외 투자 PEF, 1년 만에 70% 소진…“국내 매물 비싸 해외로 눈돌린 게 계기”
지난해 9월 290억원 규모로 결성된 글로벌바이오성장 제1호 PEF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를 포함, NS인베스트먼트와 KDB캐피탈 등 3곳이 공동 운용(Co-GP)하고 있다. 공동 운용사들은 해당 PEF를 통해 현재 국내 기업 3곳, 해외 기업 3곳에 각각 투자했다. 연말쯤 2곳 정도 더 투자해 PEF를 모두 소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보통의 PEF가 약 4년에 걸쳐 투자하는 데 비해 빠른 속도다. 해외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다.
“美, 시리즈A에 1000억원·대표 업력 30년 등 우리와 차원 달라”
교수에 이메일로 연락·‘캐피탈콜’하고도 텃세로 무산되기도…“첫 투자 후 신뢰 얻어”
김 전무와 이 상무는 좁은 문을 끊임없이 두들겼다. 이 상무는 “노벨상에 노미네이트된 유명한 교수이자 벤처기업 대표들에게 ‘당신 논문이 매우 훌륭하다.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뒤 연락이 오면 전화하고 직접 만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첫걸음을 뗐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맺은 인연을 통해 VC 대표들을 만나 우리 펀드를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치니 ‘이번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같이 투자해보자’는 제안이 오더라”고 전했다. 이 상무는 멋쩍게 웃으며 투자가 성사된 과정을 설명했지만 첫 투자까지는 펀드 결성 후 반년이 걸렸다. 그간 수백 개의 후보군을 스터디했다. 투자 집행 바로 전 과정인 캐피탈콜까지 진행되고도 미국 내 VC들의 텃세로 무산된 게 6~7번은 됐다. 이 상무는 “공동 투자자(Co-investor)로서 300만 달러 정도의 작은 규모의 투자였지만 첫 투자인 만큼 희열이 있었다”며 “그 뒤부턴 딜 진행도 중 실패하는 경우도 확 줄었다. 이번에 투자한 한 업체가 향후 우리 펀드의 재투자를 받는다는 계약을 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셈”이라고 자평했다.
“선진 바이오 기업 투자하면 ‘노하우’ 유입돼”…2·3호 펀드로 국내 바이오 ‘업그레이드’ 목표
이들에겐 미국과 국내의 바이오벤처 및 투자 업계를 연결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이 미국에 뒤처져 있는 만큼 활발한 해외 투자를 통해 업계 전반을 한 단계 승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우리가 해외 선진기업에 투자하면 그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국내로 유입이 된다”며 “이번에 투자한 한 미국 신약 개발 업체는 국내에서 치료제를 생산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성사되면 이 과정에서 오고 가는 정보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무는 “해외 VC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통해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VC들도 우리에게 그쪽 인맥이나 딜 진행방식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글로벌바이오성장 제2호, 3호 PEF를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통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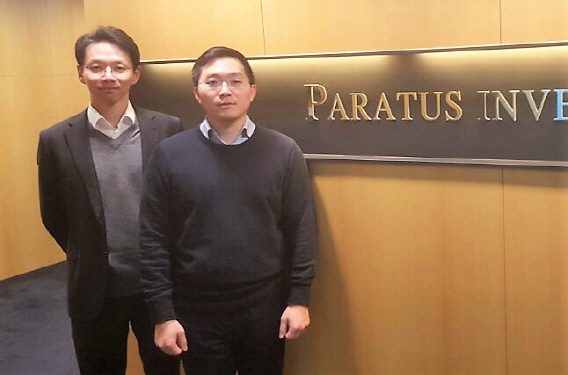






![[포토] '금융권 공감의 장' 인사말하는 오화경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932t.jpg)
![[포토]경북 국립의대 신설 촉구,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846t.jpg)
![[포토]손태승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794t.jpg)
![[포토]내년에 또보자 가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715t.jpg)
![[포토]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655t.jpg)
![[포토]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583t.jpg)
![[포토]정부, 국무회의에서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579t.jpg)
![[포토] 이즈나 데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500181t.jpg)
![[포토]첫 싱글 '라스트 벨'로 돌아온 TWS](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500118t.jpg)
![[포토] 의원들과 인사나누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50098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