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지난 1991년 출간된 자서전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돈이라는 척도로 평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 사실 고인의 이름이 세인들 입에 오르내리고야 마는 주된 이유는, 그가 기업인으로서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기 때문일 테다.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세인은 그를 끝내 다르게 본다. 그에게는 왕회장이라는 별칭을 줬다. 그가 세상을 뜬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국민들은 해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수위에 그 이름을 올린다. 이따금 부패한, 혹은 이권 다툼에 골몰한 기업인의 이야기가 신문·방송에 등장할 때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 회장을 회고한다. 꽤 다수의 혹자는, 정 회장과 같은 기업인이 그립다며 희구하고야 만다. 정 회장은 자신이 `원했던 바`를 상당 부분 이룬 채 영면했다.
그는 생전에 어떤 마법을 부렸나.
◇ 소 500마리 몰고 訪北..실향 아픔을 `실천적 기여`로
|
정 회장은 같은 해 10월 민간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방문, 숙원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성사시켰다. 이후 개성공단 사업, 통일농구대회 개최, 남북철도 연결 사업 등을 잇따라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00년 6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휴전 이후 냉랭했던 남북 관계에서 화해 무드를 조성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
더욱이 정 회장은 90년대 초반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시 대통령을 만나 남북 통일 이후 자원 개발 등의 문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등 꾸준히 관련 비전을 세웠다. 그 이면에는 정 회장 자신이 18세에 아버지 소 판 돈 70원만 갖고 가출한 실향민 출신이라는 동기가 있다. 당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실향민들이 정 회장의 방북을 지켜보며 묵묵히 지지한 데는, 시대적 아픔에 대한 공감대가 자리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아들인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며느리인 현정은 현 현대그룹 회장 등은 정 회장의 유지를 차례로 계승, 대북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기업인이지만 그 이익을 거두어가는 곳은 정부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세액을 뺀 나머지 30퍼센트를 다시 고용 증대와 재투자에 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업이란 국가 살림에 쓰이는 세금의 창출에 큰 몫으로 기여하면서, 보다 발전된 국가의 미래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생활을 보람으로 일하는 덩어리이지 어느 개인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뽐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 자서전 중에서
정 회장은 대기업이 커질수록 나라 경제가 불균형해지고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보는 일부 시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 "기업이 무한히 성장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나라 밖의 부를 끌어모아야 한다"며 "기업은 국내에 많은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기업의 크기를 갖고 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라, 대기업이 국내에만 주저앉아 시장을 독점하고 국제 경쟁 가격보다 비싼 제품을 국민에게 파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오늘날 대기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탁상공론만 반복하고 있는 일부 정·재계 관계자가 있다면, 혹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내수에 안주한 채 자사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일부 기업이 있다면, 새겨 들어봄직한 이야기다.
|
20세기 왕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태동·성장 과정에서 혹 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남은 몫은 21세기 '포스트 정주영' 시대를 사는 우리 경제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진정성을 담은 노력과 불굴의 의지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일구는 것, 일세를 풍미했던 왕회장의 경영 인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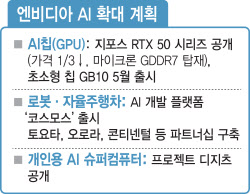





![[포토] 맘스홀릭베이비페어 전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1108t.jpg)
![[포토]수도권 첫 한파주의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1027t.jpg)
![[포토]'무죄'받고 이동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98t.jpg)
![[포토]기자회견 하는 김상욱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87t.jpg)
![[포토]전국정당을 넘어 K-정당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48t.jpg)
![[포토]발언하는 권영세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599t.jpg)
![[포토]포즈 취하는 팀테일러메이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134t.jpg)
![[포토]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내일 체감온도 영하 17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820t.jpg)

![[포토] 김혜수, 나홀로 화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074t.jpg)

![[포토]홍재경 아나운서,론칭쇼 진행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22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