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총영사관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난 1990년 당시 외교관이 2000명 정도였는데, 3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90년 행정고시(34회)에 합격해 중앙부처와 청와대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했다.
|
김 총영사는 “일본의 외교관은 6000명 이상이고, 거기에 엔지니어와 의료 등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1만명에 육박한다”며 “한국의 외교관 규모는 일본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권, 환경, 산업 등 온갖 이슈들이 쏟아져 업무량은 더 많다”며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 10대 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외교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뉴욕총영사관 역사상 첫 비(非)외교부 ‘특임’ 총영사로서 지난 6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영사는 “한국 사회는 해외 공관 근무를 두고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폐쇄적”이라며 “해양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한국은 글로벌 전략이 생존과 번영의 문제인데, 해외 공관 예산부터 깎는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축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는 미국에서 유학한 이후 미국에서 취업하고 싶음에도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유학생들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대표적인 비자가 H1B(전문직 취업 비자)다. 미국은 이 비자를 추첨을 통해 1년에 학사 졸업자 6만5000개를 발급한다. 한국인 졸업생은 이를 받지 못하면 울겨 겨자 먹기식으로 큰 돈을 들여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체 취업비자 쿼터가 무제한이다. 호주(1만500개), 싱가포르(5400개) 등도 적지 않다. 김 총영사는 “호주가 어떻게 1만500개를 확보했는지에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 미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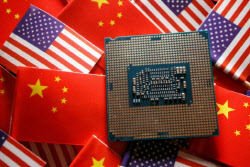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매그7' 일제히 상승…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300132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