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풀리는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면 지수를 띄울 만 하다. 과거 증권가는 추석을 호재로 인식해온 경향이 있다. 1995년 9월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은 데는 `시중 풍부한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온 덕`으로 평가된다. 공교롭게 추석 직후였다. 당시 ‘추석 연휴 직후 하루에 500억원 안팎의 자금이 매일 증시로 유입’(한겨레)됐고, `풍부한 유입자금이 주가 상승을 선도해갈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성적으로 보면 추석 호재를 뚜렷하게 감지하기 어렵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추석 직후 장에서 6차례 올랐을 뿐이다. 지수는 2010년 0.76%(13.97포인트), 2013년 0.19%(3.83포인트), 2015년 1.03%(19.96포인트), 2016년 0.82%(16.42포인트), 2017년 1.64%(39.34포인트), 2018년 0.7%(16.26포인트) 각각 올랐다. 최근 4년 연속으로 지수가 연속 오른 게 특징이다. 반대로 코스피는 2009년 1.7%(28.51포인트), 2011년 3.52%(63.77포인트), 2012년 0.01%(0.18포인트), 2014년 0.74%(15.25포인트) 각각 내렸다.
추석을 호재로 인식하기는 유통업계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를 보면, 지난해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9% 증가한 게 예다. 제수와 선물 용품 수요가 한해 장사를 좌우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 1980년대만 해도 유통가에서는 추석 매출을 부풀려 발표하는 게 다반사였다. 경쟁사에 뒤지기 싫어서 그랬다고 한다.
올해는 두 가지 변수가 겹치는 추석이라 주목된다. 9월 중순으로 상대적으로 이른 추석이 농산물 수확 시기와 맞물린 동시에 지난주 전국을 휩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부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량 확보가 문제이지만 무리하면 수지가 맞지 않아 골치다. 제때 털어내지 못하면 추석 이후 남는 재고도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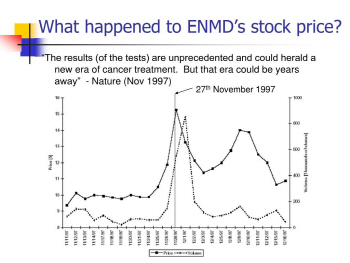













![[포토]스케이트 타는 시민들로 북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317t.jpg)
![[포토]기름값 10주째 올라…전국 휘발유 평균 1652.2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258t.jpg)
![[포토]크리스마스 분위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248t.jpg)
![[포토]'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좋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768t.jpg)
![[포토] 나인퍼레이드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496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232t.jpg)

![[포토]영화 속 배경에서 찰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1369t.jpg)
![[포토] 아수라장된 기자회견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1115t.jpg)
![[포토]다양한 식음료가 한 자리에, '컬리 푸드페스타 2024'](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958t.jpg)

![[포토]안소현-김성태 본부장,취약계증 후원금 전달식 진행](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400036h.jpg)
![40년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AI 붐에 대비한 '이 사람'[파워人스토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300015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