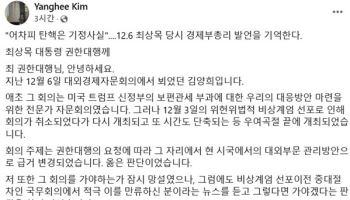[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온도가 올라가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95도쯤 왔다고 봅니다. 아직 끓지는 않지만 조만간 끓어 넘칠 시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원희목(6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미래에 대해 “어느 한 기업의 특별한 성공 케이스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한 단계 성장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했다. 120년 국내 제약업 역사에서 지금처럼 경쟁력이 축적된 시기가 없고 정부도 신산업 100대 과제에 제약업을 선정할 만큼 안팎으로 성장을 위한 발판이 제대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올해 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화학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제약업에 차세대 약으로 손꼽히는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의도에서다. 실제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195개 중 약 25%인 50여개 회사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 사이의 기술협력이나 지분투자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활발하다. 원 회장은 “화학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며 “모두 신약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업계는 전형적인 내수업종이다. 전체 시장규모 20조원 중 85%가 내수매출이고 15% 정도만 수출이 차지한다. 한정된 시장이다 보니 회사 규모도 작다. 전세계 50위권 제약사들의 매출이 약 2조5000억원 규모인데, 국내 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정도가 1조원대를 기록할 뿐이다. 원 회장은 “결국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도전 외에는 해법이 없다”며 “신약은 신약대로 복제약은 복제약 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29종이다. 하지만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약은 LG화학의 제미글로, 보령제약의 카나브 정도만 꼽힐 뿐이다. 원 회장은 “만드는데 의의를 둘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적응증을 넓히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국산 신약을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쓰게 하는 등 국산 신약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는 신약개발 초기 단계의 결과를 외국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상용화까지 마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성공하지 못하면 막대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 회장은 “벨기에와 같이 후보물질을 인수한 외국 제약사가 자국에서 후속연구를 진행하면 전폭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등 선진 기술을 끌어들일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민간 기업은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알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산 신약이 상업화에 실패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은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그의 설명이다. 원 회장은 “지금까지는 백지 상태에서 좌충우돌하며 신약을 개발했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실패의 경험이 축적된 만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약개발에 도전할 수 있다”며 “특히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국내의 우수한 IT 경쟁력이 신약개발에 적용되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이미지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원 회장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정상적인 경쟁을 정책을 바라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보다 강도 높은 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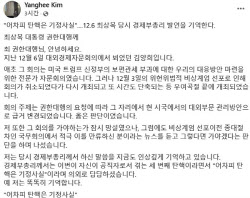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 정청래 단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42t.jpg)
![[포토] 윤석열 법률대리인 헌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31t.jpg)
![[포토]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609t.jpg)
![[포토]입장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46t.jpg)
![[포토] 달려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15t.jpg)
![[포토]이재명 "한덕수·국민의힘 내란 비호세력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 추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363t.jpg)
![45년간 자리 지킨 ‘포프모빌’…전기차로 바뀌었다는데[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800166h.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