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배기 손주를 둔 김판식(85)씨의 말이다. 김씨는 언젠가 길을 가다가 아이 엄마들이 “할아버지들은 냄새가 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한 후 샤워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김씨이지만,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는 손주를 맞이할 때도 냄새를 신경 쓰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씨 이외에도 70~80대 고령층은 노인이라면 무조건 냄새가 불쾌할 거라고 생각하고 피하는 시선에 움츠러든다고 입을 모은다. 60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막 60대가 된 이모(61)씨도 노인 냄새가 나기 시작할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다. 이씨는 “딸이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 댁에 가거나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며 “자식들한테는 좋은 냄새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쾌한 냄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매일 딸한테 ‘나도 노인냄새 나냐’고 물어본다”고 걱정했다.
|
일부 노인들은 이 냄새가 난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임 교수는 “혼자 살면 청결 관리에 소홀해지고, 나이가 들면 후각이 떨어져 냄새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했다.
외출할 일이 줄어들며 냄새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다. 김씨는 “나이 먹으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관계가 떨어지지 않나. 만날 일이 없다. 그럼 스스로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쓸 일이 없다”며 “그래서 자주 안 씻다 보니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했다.
잘 씻고 청결 유지하는 게 유일한 대안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귀 뒤, 겨드랑이 등 관절부위나 배꼽 주변, 음부 등이 취약한 부위”라며 “잘 씻고 위생관리 잘하고 옷을 잘 세탁해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정 교수는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 습도가 떨어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져 건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2~3일에 1번 씻고 보습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노인들이 냄새로 인해 위축되거나 편견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노인냄새가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에 따른 것이라는 젊은 층의 이해도 필요하다. 임 교수는 “노인냄새는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의 노화와 호르몬 분비에 따른 현상이다. 노네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을 젊은 층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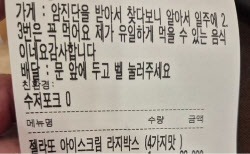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강 건너고 짐도 나르고…‘다재다능’ 이상이의 무한변신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3000131h.jpg)


![선도지구 탈락 지역, 행정소송 가능할까?[똑똑한 부동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300012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