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드러운 풀밭이나 폭포수가 떨어지는 물웅덩이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모델들이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며 뛰어다닌다. 흔히 볼 수 있는 ‘샴푸광고’의 한 장면. 보통 이런 광고에 등장하는 엑스트라가 있다. 꽃과 나비, 강아지나 고양이. 하지만 말벌이나 전갈, 거머리는 볼 수가 없다. 판매에 타격을 주는 ‘비호감’ 생물들은 빼버리고 자연의 형상은 늘 반쪽뿐이다.
‘무독성’ ‘유기농’ ‘친환경’ 등 우리 주변의 자연에 대한 이미지는 온통 긍정적인 것뿐이다. 그렇다면 자연은 정말 평화롭고 온화한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다. 박쥐전문가이자 일일 과학 프로그램인 ‘데일리 플래닛’의 진행자인 저자는 이렇게 기형적인 환상으로 포장된 자연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연은 쉼 없이 변화하고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역동적인 삶과 죽음의 드라마며, 오로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이기적인 행위가 난무하는 잔인한 전쟁터라는 것이다.
저자는 탐욕·색욕·나태·탐식·질투·분노·오만이라는 인간의 7가지 죄악을 자연에 대입해 그 안에서 펼쳐지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투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샌드타이거상어는 발생이 가장 빠른 첫째 새끼상어가 어미의 자궁 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다른 난낭과 그 안의 형제들을 먹어치운다. 보석말벌은 바퀴벌레에게 특히 잔인하다. 침으로 바퀴벌레를 꼼짝 못하게 한 뒤 그 몸 속에 알을 낳고 땅에 묻는다. 더 끔찍한 사실은 말벌의 애벌레가 성체가 돼 바퀴벌레의 몸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퀴벌레가 살아 있다는 점이다. 살아 있는 숙주의 몸에 알을 낳는 ‘포식기생자’는 곤충의 약 10%에 달한다. 자연 곳곳에 사는 수많은 동식물이 이런 고문을 당한다는 말이다.
책은 환상을 깨는 추하고 잔혹한 자연세계를 소개하는 한편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갖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저자의 사적인 여정도 보여준다. 사실 자연은 인간을 배신한 적이 없다. 단지 인간이 꾸며낸 거짓된 환상이 배신했을 뿐이다. 결국 인간의 손으로 자연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부심’이라는 저자의 확신은 의미심장하다. 그 자부심으로 대자연을 직시하고 진정한 생존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동물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있는 증거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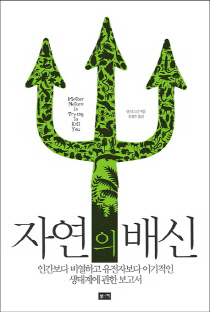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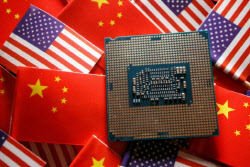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