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 몇 년쯤 머무르다 귀국한 이들이 서울의 공항로에 접어들었을 때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어마어마한 간판들’이다. 건물 외벽에는 벽면의 재질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간판들이 들어차 있다. 그것도 부족한지 유리창까지 광고 문구로 도배하고 상점 앞에 입간판을 세운다. 따지고 보면 그 많은 간판은 우리나라 군소 자영업자들이 튼실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간판 과잉 현상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의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그동안 한국 도시의 간판들이 너무 심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크기뿐 아니라 디자인 측면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도시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국가들에 가보면 대체로 간판은 최소한의 정보를 주는 정도로 숨어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나라 도시들의 심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간해서 들을 수 없다. 여기에는 추해 보이는 간판이 한 원인이었으리라 짐작한다.
한때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은 주변의 모든 약국을 압도할 만큼 튀는 간판을 새로 내걸었다. 그 간판은 짙푸른 바탕에 두꺼운 흰 고딕 글꼴 상호를 올린 것이었다. 그러자 언저리 약국들이 너도나도 비슷한 것들로 간판을 통일시키게 됐다. 짙푸른 것 말고 빨간 바탕이 혼재됐을 뿐이었다. 그 이후로 몇십 년이 흐르도록 서울의 간판 중 태반이 파랗거나 빨간 바탕에 흰색의 고딕체 상호를 내걸었다.
도시의 추함이 어디 간판뿐일까. 회색빛 가로를 질주하는 승용차들은 택시와 자가용 할 것 없이 무채색 일색이다. 많이 다양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회색빛이다. 흰색과 검은색 같은 회색 조 차들이 관리하기에 편하다는 사실은 안다. 하지만 이제 서울의 대기도 많이 정화되었으니 다양한 색깔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될까.
우리는 생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소한 것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거대한 담론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닐지. 우리의 정신과 감성이 황폐하고 강퍅해지는 건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온갖 무채색의 사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은 아닌가 싶은 것이다.
서울의 간판 중에는 여전히 1m 가 넘는 형광등을 수십 개씩 집어넣은 과대 증후군의 간판들이 많다. 거기에 발광 다이오드(LED)가 범벅이 되면서 사람들은 24시간 어둠을 모르는 밝은 세상에서 진정한 휴식을 모르게 되었다. 밤을 잃어버린 도시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멈춤과 반성을 인위적으로 빼앗긴 기계 인간 도시다.
한국의 도시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여준 ‘과대 과잉 간판’이야말로 이 사회가 지니고 있던 병리 현상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크고 요란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작더라도 개성 넘치는 간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곧 헤게모니만을 추종해 온 우리 삶의 양태가 변화하는 징표라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도시들이 다양하고 다정한 간판들로 넘쳐날 때, 우리나라도 누구나 제 삶을 즐기고 누리는 복지국가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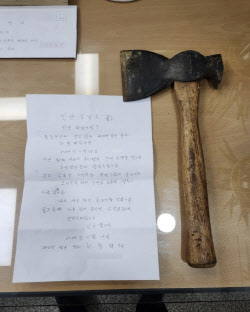





![[포토]12월 LPG 국내 프로판 가격 인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32t.jpg)
![[포토]초코과자 가격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24t.jpg)
![[포토]점등 앞둔 사랑의 온도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312t.jpg)
![[포토]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94t.jpg)
![[포토]짙은 안개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100227t.jpg)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반백년 두 가정 두고 살아온 할아버지의 상속 고민, 결국[별별법]](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07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