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신임 대표로 선임된 공동창업자 김형설 메쉬코리아 부사장이 신청한 자금 차입과 회생채권 변제 계획안(DIP·Debtor In Possession)을 승인했다. hy가 800억원에 지분 65~67%를 인수하는 조건이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
그러나 과거를 떠올리면 아쉬움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2021년만 해도 5000억원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내친김에 1조원 기업가치로 투자유치를 나섰던 메쉬코리아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몸값이 곤두박질쳤다. ‘조금만 더 투자를 받았더라면’이라는 가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유다.
메쉬코리아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메쉬코리아는 지난달 25일 김형설 부사장 등 사내 이사진을 주축으로 이사회를 열고 김형설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및 hy 매각 안건과 함께 창업자인 유정범 의장 해임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회사 창업주를 회사에서 몰아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그러나 메쉬코리아 측은 유 전 의장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끝났고 대출 상환, 대표이사 변경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창업주에게 기업은 ‘자식’으로 비유되곤 한다. 밤낮 가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바쳤고, 그 결과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회사를 보면 자식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열과 성을 다하던 회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전처럼 돌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이 그간 보인 행보는 회사 임직원은 물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10월 6일 ‘턴어라운드와 성장을 위한 M&A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OK캐피탈과의 합의를 통해 경영권 매각을 공동 추진한다고 알렸다.
유 의장 측은 급기야 매각 사실을 알린 지 두 달 후인 12월 2일 ‘회사 매각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입장을 바꾼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앞선 2019년 학력·경력 위조에다 최근 불거진 회사 자금 인출 논란은 덤이다.
최근 일어난 메쉬코리아 상황을 보며 ‘내가 창업한 기업은 오롯이 내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내가 처음 시작했으니, 당연히 내 것이지’라는 발상은 임직원과 거액을 베팅한 투자자들에게는 공감을 받을 수 없다. 수천억원 기업 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도 모자라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오는 9일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메쉬코리아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 메쉬코리아 사태를 묻는 말에 한 자본시장 관계자의 짧은 답변으로 끝을 맺으려 한다. “회사가 커지고 구성원이 늘수록 의사 결정이나 재무 구조가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회사는 창업주만의 것이 아닌 임직원들과 투자자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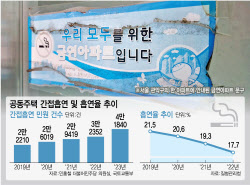



![[포토] 이동민 '우승트로피 번쩍 들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177t.jpg)
![[포토]'덕수궁의 가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295t.jpg)
![[포토]수능 대박 기원을 담은 소원카드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272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171t.jpg)
![[포토] 송민혁 '응원에 감사드립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200142t.jpg)
![[포토] 송민혁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노린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474t.jpg)
![[포토] 화사, 매력적인 자신감](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93t.jpg)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마다솜-정주호,우리가 또 해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30020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