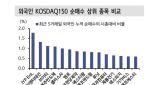|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만난 김기경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상무)는 상장예비심사에서 거래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는 VC와 투자자 등 시장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그는 “장외에서 네임밸류가 높은 기업을 실제로 뜯어보면 허수인 경우도 많다”며 “거래소가 기업을 상장시키는 것은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 건데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품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상장예심 판단, 기본은 ‘경영투명성’
상장청구회사는 VC나 주관사에 경영정보를 포장하거나 편집해 제공할 수 있지만 상장을 청구한 거래소에는 가감없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거래소측 설명이다. 제출자료 중 허점이 보이면 거래소로부터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김 본부장보는 “청구기업이 라이선스 아웃(기술수출)을 한 경우 거래소는 공시되는 내용 외 계약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다. 업프론트(선급금)가 많아 보여도 이에 버금가는 임상 1상 비용을 청구기업이 전액 부담해야한다면 기술수출 성과를 마냥 고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김 본부장보가 밝힌 상장예심에서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청구기업의 ‘경영투명성’이다. “기술력은 당장 모자라더라도 상장 이후 개발이 가능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공모자금이나 투자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제대로 된 기술개발조차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실제로 상장예심에서 ‘미승인’을 받은 기업들 중에는 기술성이나 사업성 평가보다는 내부통제 이슈에서 미승인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본부장보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미승인받은 기업이 자사의 미승인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거래소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낮게 받았다고 외부에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거래소가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청구기업이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기업공개(IPO) 문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본부장보는 “최근 바이오텍 창업이 늘었는데 화수분처럼 매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들이 꾸준히 같은 숫자로 수십개씩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IPO 문턱을 넘는 바이오 기업이 꾸준히 일정 수준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표준기술평가 모델, 기술성평가 신뢰성·신속성 높일 것”
같은 회사를 두고 기술성평가 결과가 들쑥날쑥하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큐로셀은 지난달 두 곳의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두 등급 차이가 나는 평가(A, BB)를 받았다. 거래소는 기술평가기관들에 대략적인 모델을 제시하면 평가기관들이 이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되므로 비교적 일관성있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표준기술평가 모델의 또 다른 기대효과는 기술성평가의 신속성이다. 지금은 기술성평가에 대한 수요에 비해 기술평가기관의 수가 적다. 기술평가기관은 22개지만 품은 많이 들고 수익성은 좋지 않은 기술성평가를 꺼리는 곳도 많아 실제 지속적으로 평가업무를 하는 곳은 이보다 더 적다. 하지만 표준기술평가 모델이 나오면 기술성평가를 원하지만 문턱이 높아 진입하지 못했던 곳들이 새로 평가기관에 합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기술성평가 차례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본부장보는 “표준기술평가 모델을 기술평가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연구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며 “‘기본형’, ‘심화형’으로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 기존 평가기관들은 기본형을, 새로 진입하는 평가기관들은 심화형을 참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인데’ 국방위 회의실서 게임한 장성 시끌 [영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100339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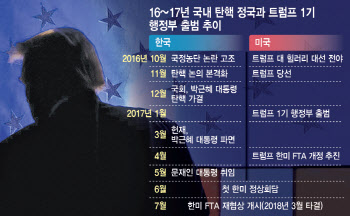








![[포토]탄핵 정국 연말 특수 기회 사라진 식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001231t.jpg)

![[포토]조정훈-조지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000859t.jpg)
![[포토]국방위, '軍의 눈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000666t.jpg)
![[포토] 교보문고, 한강 작가 초상화 전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000577t.jpg)
![[포토]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국기에 대한 경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000570t.jpg)
![[포토]김학균 센터장, 야당 정무위 대상으로 설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000537t.jpg)
![[포토]최고위, '대화하는 이재명-김민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000403t.jpg)
![[포토] 한덕수 총리, 사랑의열매 성금 기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900876t.jpg)
![[포토]채용게시판 살피는 구직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900798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