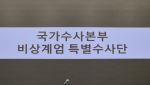벌써 올림픽만 다섯 번째였다. 메달은 없었다. 불혹의 나이에 ‘이번이 마지막’이란 조바심이 온통 그를 얽어맸을 터다. 런던올림픽 최고령 선수, 전설의 윤경신(40·남자 핸드볼) 선수 얘기다.
윤경신은 1990년 처음으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1992년 바르셀로나,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그리고 올해 런던에서의 마지막 올림픽도 노메달로 맞게 됐다.
20년 동안 흘린 땀을 메달과 바꾸지 못한 안타까움. 누군들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노메달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쉬이 얘기하지만 총성 없는 전쟁터인 올림픽에서 패자는 패자로만 기억되는 것이 현실이다. 땅이 꺼질듯한 한숨은 오직 노모(老母)만이 이해할 뿐일 것이다.
|
언론은 그를 두고 ‘핏빛 투혼’, ‘붕대 투혼’이란 말로 그의 땀방울을 위로했지만 노메달이 그동안의 피와 땀에 위안이 되진 못했을 터다. 하지만 그는 금메달보다 더 큰 것을 안겨 줬다. “나는 뼈가 부러져도 싸울 수 있다”는 한 마디의 결의. 붕대를 맨 그에게서 느낀 굳센 의지는 도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 그 큰 울림은 국민들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서른아홉에 자전거 페달을 밟은 조호성(39·남자 사이클) 선수.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포인트레이스에서 4위에 그친 아쉬움을 이번 런던에서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성적”이라며 “다음 기회가 없어 안타깝다”는 아내 황원경(33)씨의 말을 듣고 그가 느낀 아쉬움은 더욱 컸을 것이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아내를 으스러지게 안아줄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부상으로 메달을 따지 못한 채 쓸쓸히 경기를 마쳐야 했던 장미란(30·여자 역도) 선수. 주어진 순간, 주어진 무게를 들어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베이징 때보다 한참 못 미쳐서 국민들이 실망하셨을까봐 염려된다”며 새벽잠을 설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경기소감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절절하게 했다.
윤경신, 황희태, 조호성, 이현일, 장미란 등 노메달의 전사들. 금메달보다 값진 감동을 선사한 이들은 대한민국 ‘국격’을 한층 더 끌어올린 최고의 전사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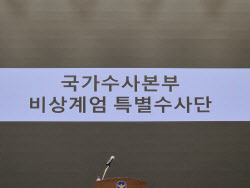



![[포토]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가결...즉시 직무 정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1103t.jpg)
![[포토] 작품이 된 생활용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968t.jpg)
![[포토]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952t.jpg)
![[포토] 롯데뮤지엄, '뷔르템베르크 왕실의 주얼리 세트' 전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56t.jpg)
![[포토]법정 나서는 조국혁신당 의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41t.jpg)
![[포토]야6당,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20t.jpg)
![[포토]이재명 대표 만난 정순택 대주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16t.jpg)
![[포토]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중진 권성동 의원 선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800t.jpg)
![[포토]與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동훈도 ‘찬성’ 돌아섰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673t.jpg)
![[포토]발표하는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200511t.jpg)
![[포토]박현경,자기 관리 중요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100160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