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 아파트에 사는 이형국(59·가명)씨. 은퇴후 미세먼지 없는, 공기 좋고 조용한 강원도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지만, 막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그는 전원주택 용지를 고르기 위해 홍천과 춘천 일대를 다녀왔다. 하지만 주변에 쾌적한 환경만 보고 탈서울을 감행하는 게 옳은지 회의감이 생긴다. ‘평생을 대도시에서 부대낀 내가 한적한 시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나 자신이 이미 도시 생활의 편리성에 중독된 게 아닐까.’ 더욱이 아내의 시큰둥한 반응도 이씨의 고민이 깊어지게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아파트 부녀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사교적인 성격의 아내는 목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다. 이씨는 “전원행은 내 행복을 위해 아내의 행복을 빼앗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누구나 바쁜 도심을 떠나 평온한 전원의 삶을 즐기고 싶지만 많은 사람이 냉엄한 현실 앞에 갈등이 깊어진다. 설문 조사를 하면 나이 들어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응답은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시골 또는 교외에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언덕 위의 하얀 집에 살기 위해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애와 결혼생활이 다르듯이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전원 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답답한 현실의 탈출구로써 전원생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설문 조사의 응답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전원의 꿈은 과대 계상된 셈이다.
전원행을 시도했던 일부 사람들은 쓰라린 실패를 맛본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무조건 부동산 매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부동산은 공산품처럼 반품이 쉽지 않다. 서둘러 집을 덜컥 짓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빌려 써본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완충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골 생활 적응에 실패, 벗어나고 싶어도 이미 사들인 부동산의 매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함부로 선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일이다. 내 것이 있어야 성공적인 전원생활이 될 것이라는 선입관부터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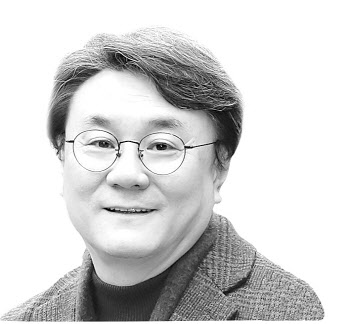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메가캐리어 대한항공…4년 만에 이룬 조원태의 ‘큰 날개’[증시 핫피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3000069b.jpg)
![차기 우리은행장에 임종룡 인사 낙점, 조직쇄신 신호탄 될까?[위클리금융]](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3000090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