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겁나면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처분하는 게 좋겠다며 은근히 눈총을 주며 채근해도 도무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설령 세금을 두드려 맞더라도 집값이 더 오른다면 구태여 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미 수도권 전역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까지 모두 집값이 오른 상태다. 애초 표적이 됐던 서울 강남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풍선처럼 퍼져가는 부동산 정책의 역설이다.
고위 공직자들도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해야 하는데도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분위기다. 여분의 주택을 처분했다는 경우에도 꼼수가 난무한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려다 민심의 직격탄을 맞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아들에게 증여하고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마찬가지다. 장·차관과 국회의원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수두룩하다. 온갖 대책이 발표된다 한들 시장을 설득시킬 수 없었던 이유다.
일반인들에 있어서도 엄연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 과도하게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 객관·형평성을 잃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제기된다. 요즘 발부되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서울지역은 20~30% 오른 게 보통이라고 한다. 달랑 집 한 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앉은 채로 ‘세금 폭탄’을 맞은 꼴이다. 명색이 자기 집에 살면서도 정부에 기간별로 월세를 내는 양상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비싼 집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가 존재하는 법이다.
지금 여건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팔려고 내놓아도 대출규제로 인해 사겠다는 임자가 나서지를 않는 것이다. 과거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거나 집칸을 넓혀 옮기려면 알뜰살뜰 부은 적금에 대출이나 전세 끼는 방법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모두 막혀버렸다. 과거의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까지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들은 한숨을 지으면서도 다음 대통령선거를 내다보는 중이다. 시중의 불만이 팽배한 만큼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실태에 대해 모른 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투기 단속은 마땅하되 왕복 달리기하듯 신뢰를 깎아 먹는 대책의 되풀이만큼은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논설실장>







![[포토]포즈 취하는 팀테일러메이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134t.jpg)
![[포토]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내일 체감온도 영하 17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820t.jpg)

![[포토] 김혜수, 나홀로 화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074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734t.jpg)
![[포토]외환시장 점검 간담회, '발언하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653t.jpg)
![[포토]운영위 현안질의 불출석한 대통령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624t.jpg)
![[포토]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하는 김민석 최고위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518t.jpg)
![[포토]'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492t.jpg)
![[포토]설 앞두고 장보기 주저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724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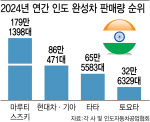
![[포토]홍재경 아나운서,론칭쇼 진행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22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