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구 기자] 은행 거래를 할 때마다 스치는 생각이 있다.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 거래 고객은 이자를 바라보고 저축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액수를 보면 참 터무니없다. 반면 대출받은 변동금리는 자동차 기름값과 똑같다. 오를 때는 지체없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재산 증식수단으로서의 은행이 아니라 티끌 같은 돈마저 갉아먹는 ‘사기꾼’이다. 그래서 요즘엔 현금을 집 안 장롱에 묻어두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 않나.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파산하자 이 같은 생각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은행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계좌 옮기기가 속출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일부 은행의 임원들은 밑빠진 독의 물이 새는데도 자신들의 성과급 챙기기에 바빴다. 미국 월가의 혼란은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됐다.
하지만 은행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다. 섬뜩하고 추악한 은행이 있는 반면 윤리적 은행, 녹색 은행도 있다. 이를 ‘보노보 은행’이라 부른다. 야심만만하고 폭력적인 유인원 침팬지에 비해 평등을 좋아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유인원 보노보를 닮았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보노보 은행은 사람과 환경,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주주 성장만을 앞세우는 기존의 침팬지 은행에 비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면서 활동한다. 침팬지 은행이 실물경제에 돈을 돌리지 않고 돈으로 돈을 벌 궁리나 할 때 보노보 은행은 기존 금융시스템 안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적극적인 금융을 지향할 뿐이다.
독일 GLS은행과 미국 뉴리소스 은행은 윤리적 금융기관으로 통한다. ‘돈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모토 아래 더러운 사업엔 돈을 대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환경산업에 우선 대출해주고 윤리적 투자를 약속한다. 경영의 투명성이다. 캐나다 밴시티와 미국 어큐먼 펀드는 공존의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성격으로 지역민의 꿈을 응원하는 자본이다. 1억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혁신사업이라면 기꺼이 1명에게 투자한다. 영국 소셜 임팩트 본드(SIB)는 휴머니즘 금융이다. 민간협력채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요즘 영화제작 등에서 차용된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다. SNS 시대에 십시일반으로 기적을 만드는 감성적 모금법이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재단 이사장,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 등 사회적 금융전문가 10인이 영미·유럽권의 보노보 은행들을 공부하고 사례를 모았다. 침팬지 은행이 내팽개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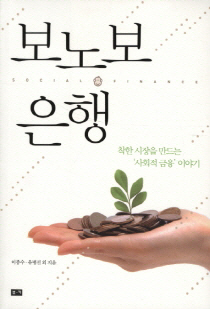





![[포토] 우체국쇼핑 "설 선물 특가로 구매하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40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하는 차량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878t.jpg)
![[포토]'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770t.jpg)
![[포토] 이동활 한우자조금위원장, "올 설에 한우드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684t.jpg)
![[포토]'유튜브 생중계 화면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614t.jpg)
![[포토]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576t.jpg)
![[포토] 추위 잊은 송어얼음낚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200345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초읽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200302t.jpg)
![[포토]설 명절 앞두고 채소값 크게 올라…배추 59%·무 77%↑](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200259t.jpg)
![[포토]'눈썰매 씽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200239t.jpg)
![[포토]박현경,백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출정식 개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20014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