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실이다. 하지만 AI 구축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수집·분석 과정의 걸림돌은 여전하다. 이데일리가 그제 개최한 ‘제3회 IT컨버전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제도규제 철폐를 한목소리로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전세계 산업·과학기술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제4차 산업혁명’이다. 증기기관 발명에 의한 1차 혁명에 이어 전기와 대량생산 체제가 가져온 2차 혁명, 인터넷 및 컴퓨터 기반의 3차 혁명이 인류가 그동안 겪어 온 발전 단계다. 이제는 4차 혁명의 높은 파고가 전세계 기업과 사회 생태계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다.
AI가 정보통신기술(ICT)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의료,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삼성전자와 KT 등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들이 이 부문에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배경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AI 분야가 2025년께 전세계적으로 6000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AI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치열하다. 일본은 이를 ‘제2의 메이지 유신’으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일본이 지난 6월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고 AI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를 웅변한다. 중국도 AI 산업 육성을 위한 3개년 실천 방안을 내놓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는 AI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하려면 날개를 달아줄 필요가 있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부작용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규제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AI혁명에 대비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첨단기술 개발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간섭과 통제로 이를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적어도 AI 분야에서만큼은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관련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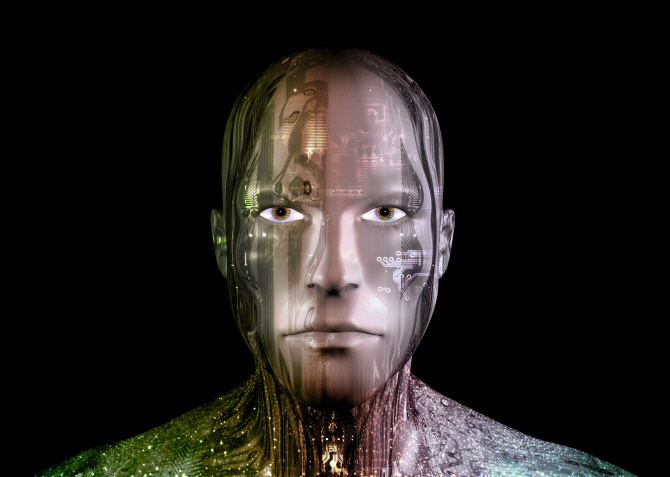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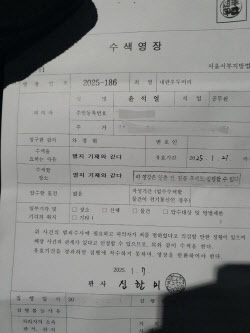



![[포토]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교통체증 불가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336t.jpg)
![[포토]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신규채용 2만4000명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899t.jpg)
![[포토] 설 명절 자금 방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72t.jpg)
![[포토] 우체국쇼핑 "설 선물 특가로 구매하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40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하는 차량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878t.jpg)
![[포토]'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770t.jpg)
![[포토] 이동활 한우자조금위원장, "올 설에 한우드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684t.jpg)
![[포토]'유튜브 생중계 화면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614t.jpg)
![[포토]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300576t.jpg)
![[포토] 추위 잊은 송어얼음낚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200345t.jpg)

![[포토]박현경,백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출정식 개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200149h.jpg)


![[속보]공수처·경찰 수사팀 일부, 尹 한남동 관저 내부 진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500389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