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서 ‘싸다’고 소개한 타이밍 벨트 상자에는 ‘정품’ 홀로그램과 큼지막한 ‘현대자동차’ 마크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중국 원저우(溫州)에서 생산된 모조 부품이다. 이런 짝퉁 부품이 브레이크 패드, 앞·뒤 램프, 사이드 미러, 휠까지 100여 종에 이른다.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생김새는 똑같지만 가격은 국산 정품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내에 들어오는 경로는 더 기가 막힌다. 중국 짝퉁업자들이 제품의 ‘국적(國籍) 세탁’을 위해 한국으로 1차 수입했다가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빼돌려 국내 시장으로 흘려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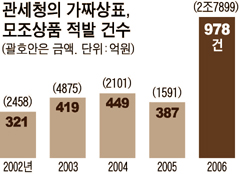 ◆원조 안방 파고드는 중국산 짝퉁
◆원조 안방 파고드는 중국산 짝퉁 해외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한국 상품 짝퉁은 어느새 우리 곁에 넘쳐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 중 짝퉁의 비율은 20%가 넘는다.
서울 종로 뒷골목에서 주머니가 가벼운 노년층에게 1000~2000원에 팔리는 ‘레종’ ‘더원’ 등의 담배 역시 밀수입된 중국산 짝퉁이다. IT(정보기술)·전자제품도 예외가 아니다. 2005년에는 국내 MP3 전문 업체 엠피오의 ‘FL350’ 제품을 똑같이 흉내 낸 중국산 짝퉁 제품이 용산전자상가에서 버젓이 팔리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용 완구와 주방용품, 각종 생활 잡화 등도 국내 업체들의 브랜드를 흉내낸 유사 상표의 중국산 짝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통 전문가들은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속이고 판매되는 중국산 농산물도 따지고 보면 짝퉁인 셈”이라며 “이렇게 보면 국내 유통에서 중국산 짝퉁의 비율은 15% 이상” 이라고 말했다.
◆진화하는 ‘짝퉁 비즈니스 모델’
짝퉁 제품이 원조가 버티고 있는 안방 시장까지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은 한층 교묘해진 제조·유통방법 덕분이다.
중고 휴대전화에서 쓸모 있는 부품만 골라내 휴대전화 알맹이(회로판)를 만들고,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짝퉁 애니콜 휴대전화 케이스를 씌워 마치 새 제품인 양 팔아먹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판매도 감시가 허술한 온라인 쇼핑몰만 이용해 짝퉁업계에 ‘첨단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혜화경찰서 안동현 사이버팀장은 “짝퉁 제조와 유통방법이 고도화하면서 단속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업체들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계도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무역협회 통상협력팀 조학희 차장은 “중국 지방정부에 짝퉁 공장 단속을 요구하면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곤란하다’는 식의 핑계를 댄다”고 전했다.








![[포토]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609t.jpg)
![[포토]인사청문회 출석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404t.jpg)
![[포토]아침 영하 10도, 꽁꽁 얼어붙은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843t.jpg)
![[포토]스케이트 타는 시민들로 북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317t.jpg)
![[포토]기름값 10주째 올라…전국 휘발유 평균 1652.2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258t.jpg)
![[포토]크리스마스 분위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200248t.jpg)
![[포토]'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좋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768t.jpg)
![[포토] 나인퍼레이드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496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232t.jpg)

![[포토]안소현-김성태 본부장,취약계증 후원금 전달식 진행](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400036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