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는 순수 아리안 혈통만을 솎아내 아리아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 유명한 ‘레벤스보른’(Lebensborn, 생명의 샘)이다. 나치는 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쟁으로 점령한 국가에서 흰 피부, 파란 눈, 금발 등 순수 아리안 혈통의 신체적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 독일로 보냈다. 아이들은 정치·인종 심사를 통과한 독일인 가정에 맡겨졌다.
책은 이 끔찍한 인종 실험의 희생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냈다. ‘레베스보른의 아이’로 선택된 생후 9개월의 ‘에리카 마트코’는 ‘잉그리트 폰 욀하펜’이라는 이름의 독일인으로 자랐다. 그는 열 살 무렵 자신에게 에리카 마트코라는 다른 이름이 있고, 자신이 위탁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예순 살이 돼서야 진짜 자신을 찾아 나설 용기가 생긴 그는 독일 곳곳의 기록보관소와 유럽 여러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레벤스보른의 진실을 파헤친다.
책은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 이야기‘에 등장하는 길리어드 시녀 제도의 모델인 ’레벤스보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려는 국가 권력의 잔인함, 순수 혈통과 우수 인종에 대한 기이한 신념으로 아이들을 납치해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광기 어린 인종주의를 고발한다. 나치의 충격적인 범죄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 치부할 수 없는 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민족과 지역, 인종 간 차별과 혐오가 다시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인종주의가 보여주는 파멸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거울같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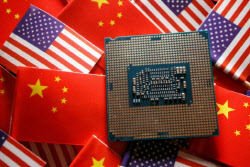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매그7' 일제히 상승…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300132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