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겸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까지 올라간다. 기업 규모가 커지며 자산 내 주식 비중이 커지는데 지분으로 상속세를 감당해야 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00년 지금의 세율로 고정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인 상속세제도를 현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상속세 과세에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법하게 소득세를 내고 상속을 하는 것인데 상속인이 추가로 세금을 내는 방식임에도 상속세 최고세율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보다 5%포인트 높다”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라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쓸 재원을 거두는 것인데 너무 많은 부담을 주거나 합리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면 기업 승계과정에서 곤란해진다”며 “장기적인 목표는 상속세 폐지로 둬야 하며 자본이득세(일종의 양도소득세)로의 대체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추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 시 혜택으로 적용되는 가업상속제도의 상속공제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고용 유지와 업종 변경, 최대주주 지분율, 자산 유지 등 사전·사후 관리 요건 같은 제도 탓에 2011~2019년 한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 평균 이용건수는 85건, 공제금액은 2365억원에 그치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4국뿐이다. 이를 토대로 입법조사처는 “개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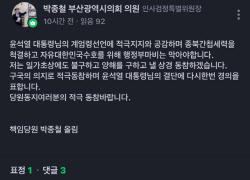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포토] 대통령실 입구의 취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817t.jpg)
![[포토]'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571t.jpg)
![[포토]'긴박했던 흔적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485t.jpg)
![[포토]조국, '국가 비상사태 만든 이는 尹...탄핵해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366t.jpg)
![[포토]尹, '비상 계엄 해제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277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90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