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제항공통신협회가 올해 발표한 수하물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 승객 1000명당 수하물 사고 발생 건수(MBR)는 전 세계 항공사와 비교해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항공업계는 발생 건수가 아닌 1000명당 수하물 사고 발생 건수를 수하물 사고 발생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운항편수가 많은 항공사일수록 수하물 사고 발생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항공을 이용한 여객은 1934만5302명이며, 수하물 분실은 2만2067건으로 1000명당 수하물 사고 발생 건수는 1.1건이었다.
올해 8월 누적기준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한 여객은 1361만1118명이며, 수하물 분실은 1만6986건으로 1000명당 수하물 사고 발생 건수는 1.2건이었다.
전 세계 항공사들의 평균 1000명당 수하물 발생건수는 지난해 5.57건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국내 항공사들의 수하물 지연·분실이 많다고 보도된 바 있지만, 오히려 해외 항공사들에 비해 국내 항공사의 수하물 사고는 훨씬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항공교통량과 승객수가 급증하지만 수하물 지연·분실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제항공통신협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수하물 사고는 70%가량 감소했다.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스템과 항공사의 수하물 추적시스템이 첨단화되면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수하물 처리시스템이 사실상 자동화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
수하물의 이동 경로는 우선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에 표(Baggage Tag)가 먼저 붙여진다. 이후 컨베이어 벨트 중간에 설치된 바코드 리더를 통해 수하물 표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긴 거리를 이동해 해당 항공편 인근의 컨테이너까지 이동한다. 컨테이너에 짐을 싣는 과정만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만 빼면 사실상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이에 항공사와 공항은 승객의 수하물 지연이나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전 세계 300여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추적·관리시스템인 ‘월드 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수하물을 관리하고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객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수하물 위치나 진행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승객이 수하물을 잃어버렸을 때 탑승한 항공편 항공사의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면 된다. 안내데스크에서 수하물 표를 제시하고, 수하물 가방의 상표나 외관상 특징, 내용품, 연락처 등을 표기하면 접수가 된다. 수하물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수하물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해야하고,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해 두는 것이 분실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하물 표를 받았을 때 본인의 이름이 맞는지, 목적지가 맞는지, 수량이 맞는지 등을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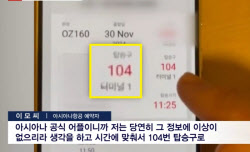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포토]최상목 "野 감액안 허술한 예산…무책임 단독 처리 깊은 유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44t.jpg)


![[단독]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1074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