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개성의 외곽 지역인 경기 개풍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서울에서 조부모의 손에 자랐다.
서울 숙명여고를 졸업한 그는 1950년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신입생이었던 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학교를 중퇴했다.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온 오빠가 여덟 달 만에 세상을 떠나는 등 그는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는다.
전쟁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으며, 그가 문학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문단 데뷔 40주년이었던 지난해 문예지 '문학의문학'에 실린 대담에서 그는 "6.25가 없었어도 내가 글을 썼을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며 6.25가 안 났으면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6.25 때 "빨갱이로 몰렸다가 반동으로 몰렸다가 그러면서 부대낄 때 얼마나 이상할 일을 다 겪었겠느냐"며 힘든 시기를 겪고 남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다, 언젠가는 이걸 쓰리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7월 펴낸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서도 그는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낸 세상은 연륜으로도, 머리로도, 사랑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 못 할 것 천지였다"고 되뇐다.
대학 중퇴 후 고인은 미8군의 PX에 취직해 일하다가 박수근 화백을 알게 된다. 박 화백과의 만남은 훗날 그의 데뷔작인 '나목(裸木)'으로 이어진다. 이 소설은 전쟁 중 PX에서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손수건에 초상화를 그려주던 박수근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1953년 결혼하고 여러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던 작가는 1970년 불혹의 나이에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이 소설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이후 그는 6.25전쟁과 분단 문제에 천착하면서 물신주의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비판적인 작품들을 발표했다.
1980년대에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1980), '서 있는 여자'(1985),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 등의 장편소설에서 여성의 억압을 다룬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여성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주목받았다.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 잃는 큰 슬픔을 겪고 가톨릭에 귀의한 그는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1994),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 '너무도 쓸쓸한 당신'(1998) 등 자전적인 소설 등을 통해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면모를 보여준다.
2000년대 '그 남자네 집' '잃어버린 여행가방' '친절한 복희씨' '세가지 소원' 등의 장편과 산문집 '호미', 동화집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등의 작품에는 오랜 연륜과 성찰에서 나오는 따뜻한 사유가 묻어난다.
구리시 아차산 자락의 마당이 있는 집에서 지내온 고인은 "기력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글을 쓸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빨리 쓰지는 않지만 좋은 문장을 남기고 싶어서 공들여 쓴다. 지금도 머릿속으로 작품 생각을 하면 뿌듯하고 기쁘다"고 식지 않는 창작의 열정을 보였으나 지난해 가을 담낭암 진단을 받았다.
10월 수술 후 치료를 받아온 고인은 지난해 말 병세가 악화돼 1주일간 입원한 뒤 차도를 보이는 듯했으나 22일 새벽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서 가까워져 오는 죽음을 내다보듯 "씨를 품은 흙의 기척은 부드럽고 따숩다. 내 몸이 그 안으로 스밀 생각을 하면 죽음조차 무섭지 않아진다"라며 죽음을 초월한 모습을 보였던 고인은 그렇게 가보지 못한, 더 아름다운 길을 찾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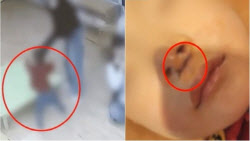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포토] 벤틀리모터스코리아,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418t.jpg)
![[포토] 2024 서울 문화원 엑스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001770t.jpg)
![[포토]이가영,정상을 바라본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