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가족들과 카페를 찾은 황모(70·남)씨는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를 눌러대는 자녀 뒤에 엉거주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계를 다루는 데에도 서툴지만 ‘솔드아웃’, ‘베버리지’, ‘더블샷’과 같은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황씨는 “까막눈이라 도통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생활 속에서 넘쳐난다”며 “자식 없으면 음료수도 주문 못할 처지가 됐다”고 씁쓸히 웃었다.
|
한국인의 기본 문맹률은 1% 수준이라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알아도 황씨 같은 이들은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한 까닭이다. 외국어 사용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외국어 이해도가 젊은층보다 낮은 노인층은 소외·불편이 커지고 있다.
주민 공동시설에서도 영어 표기가 야금야금 늘고 있다. 아파트 경비실은 ‘인포메이션’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장은 ‘리사이클’, 경로당은 ‘시니어 라운지’로 바뀌는 식이다.
집 밖을 나서도 외국어 일색이다. 카페의 메뉴, 가게들의 간판, 기업들의 이름 등이 그렇다. 최근 SNS(사회 연결망 서비스)에선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한 카페 메뉴판이 논란이 됐다. “신선한 아이디어”란 반응도 있었지만, “이건 젊은이도 못 알아본다” “영어라고 무조건 좋아 보이나”는 지적도 많았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을 적고 그 옆에 외국어를 같이 써야 하지만 이런 간판은 드물다. 한글문화연대가 2019년 12개 자치구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외국어 간판은 1704개로 23.5%를 차지했고,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간판은 1102개(15.2%)에 불과했다. 서울 강서구 김모(72)씨는 “ABC는 배웠지만 다 까먹었으니 뭐라고 읽는지 모른다”며 “간판이 외국어로 쓰여진 가게엔 들어가기가 꺼려진다”고 했다.
서현정 세종국어문화원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사업까지 외국어가 남용된 사례들이 많은데 시민들이 문제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홈트’를 ‘집콕운동’으로 바꿔 부르는 식의 참신하고 재기발랄한 노력으로 국민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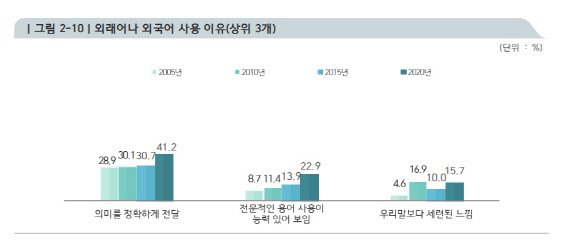






![[포토] '금융권 공감의 장' 인사말하는 이병래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936t.jpg)
![[포토]경북 국립의대 신설 촉구,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846t.jpg)
![[포토]손태승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794t.jpg)
![[포토]정윤하 등장](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056t.jpg)
![[포토]내년에 또보자 가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715t.jpg)
![[포토]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655t.jpg)
![[포토]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583t.jpg)
![[포토]정부, 국무회의에서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600579t.jpg)
![[포토] 이즈나 데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500181t.jpg)
![[포토]첫 싱글 '라스트 벨'로 돌아온 TWS](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500118t.jpg)




![“270만원 화웨이 신상폰 살 수 있어요?” 中매장 가보니[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260133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