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 벌레를 고기로 생각하며 먹고, 오줌을 받아먹는 끔찍한 벙커 안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강영숙(53) 작가가 그린 디스토피아의 모습이다. 한국일보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과감한 필치로 생의 누추한 곳을 들춰냈던 강 작가가 네번째 장편소설 ‘부림지구 벙커X’(창비)로 돌아왔다.
이번 소설에서는 지진이 휩쓸고 간 도시 부림지구의 모습과 벙커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집 안에서만 갇혀 사는 현재의 우리 모습과 겹쳐지며 삶을 곱씹어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강 작가는 7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근에 열을 재고 마스크를 한 채 친척의 빈소를 찾은 적이 있다”며 “병의 전파를 막으려면 사람들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낯설기도 하고 두렵다”고 말했다.
|
직접 겪은 지진의 기억, 소설로
“일본에서 잠깐 경험한 지진도 사실 굉장히 무서웠다. 초고는 아주 빨리 썼는데 어떤 벙커인지를 생각해내는 일은 시간이 꽤 걸렸다. 영화도 많이 보고 실제 재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재해 현장을 경험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했다. 화자 유진이 내 나이 또래의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또 나의 경험이기도 하다.”
벙커 안에는 유진을 포함해 열명 남짓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간간이 보급되는 ‘생존키트’와 벙커 밖의 쓸 만한 잔해에 의지하며 살고 있다. 오염지역의 이재민들이 부림지구를 떠나 근처의 N시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몸에 생체인식 칩을 주입하고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재난 상황 관심사…“빨리 상황 안정되길”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부림지구 벙커에서의 폐쇄된 상황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처럼 읽히지 않는 이유다. 강 작가는 “사람들이 벙커에 모여앉아 ‘지진 경험 이야기하기 대회’를 하는 장면이 있다”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장면인데, 재해란 타인과 더 대화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가뭄, 해일, 바이러스 등 재난 상황은 그의 오랜 관심사였다. 단편소설 ‘해안 없는 바다’ ‘프리파트 창고’ ‘문래에서’를 비롯해 최근 웹진 비유에 게재한 ‘스모그를 뚫고’ 등이 재난을 소재로 했다. 강 작가는 “아무리 문학이 삶과 가깝다고 해도 삶의 여러 측면을 모두 문학 안에 들여올 수는 없다”며 “재해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내다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출간작업 때문에 미뤄놨던 일들을 하느라 바쁘게 생활하고 있단다. 강 작가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 소설로 독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죄송한 마음도 있다”며 “빨리 상황이 안정돼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산책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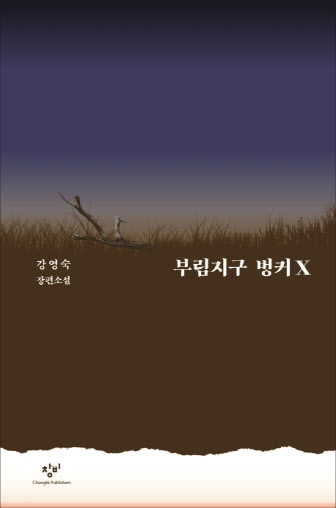






![[포토]포즈 취하는 팀테일러메이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134t.jpg)
![[포토]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내일 체감온도 영하 17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820t.jpg)

![[포토] 김혜수, 나홀로 화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074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734t.jpg)
![[포토]외환시장 점검 간담회, '발언하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653t.jpg)
![[포토]운영위 현안질의 불출석한 대통령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624t.jpg)
![[포토]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하는 김민석 최고위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518t.jpg)
![[포토]'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492t.jpg)
![[포토]설 앞두고 장보기 주저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724t.jpg)
![[포토]홍재경 아나운서,론칭쇼 진행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22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