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2~3월 모 지방검찰청 회식자리에서 “요즘 B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고 하거나, 같은 해 8월 사무실에서 “C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2019년 5월 대검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검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관 및 신규 사무원 등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 서류에 피해자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는 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돼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원고가 직장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했다는 것으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행위 유형·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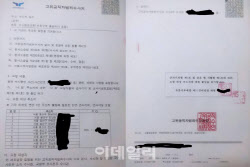



![[포토]사라진 버스 차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789t.jpg)
![[포토]권성동, '윤 대통령 생각하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633t.jpg)
![[포토] 금융통화위원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455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443t.jpg)
![[포토]권영세 '이재명 대표, 이제 흡족하십니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600419t.jpg)
![[포토]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678t.jpg)
![[포토] 코스피, 코스닥 내림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243t.jpg)
![[포토]'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로 이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58t.jpg)
![[포토] 네스프레소 2025 캠페인 론칭 토크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14t.jpg)
![[포토] '와일드무어' 미디어 행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05t.jpg)

![[포토]박현경,백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출정식 개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20014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