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대형백화점 직원과의 식사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명품 구매를 위한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물건을 사기 위해 달려가는 행위)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누다 문득 명품은 언제 사는 것이 좋을지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었다.
순간 당혹스러웠다. 1000만원을 호가하는 샤넬 백을 당장 지금 사라니. 직원은 더 목소리를 높였다. “명품은 부동산과 같습니다. 사고 묵혀두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을 명품 가격 상승세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지만 왠지 씁쓸한 뒷맛을 감출 수 없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프라다는 버킷백 등 가격을 올들어 6차례나 인상했다. 올 1월 139만원이었던 나일론 버킷백의 현재가는 179만원으로 1년동안 약 28% 올랐다. 루이비통도 올해들어 5차례 가격인상에 나섰으며 샤넬도 4차례 올렸다. 예물 가방으로 인기가 높은 샤넬의 클래식백 라인 가격은 모두 1000만원을 넘었다. 785만원이었던 클래식 스몰의 경우 현재 미디엄 사이즈는 1124만원, 라지 사이즈는 1210만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명품 브랜들의 배짱 가격인상에도 소비심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되레 수요 욕구를 더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명품 판매액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6% 증가한 142억달러(약 17조원)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캐나다 등에 이어 7번째 큰 시장 규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소비자만 봉’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명품 브랜드들의 무차별적인 가격인상에 제동을 걸 마땅한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가격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에선 집값 폭등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MZ세대들이 명품에 열광하는 세태를 꼬집기도 한다. 부동산의 대체제로 명품이 자리잡으면서 투기에 가까운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명품 소비 시장에서도 세대간, 빈부간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은 명품 브랜드들이 왜 한국을 가격 인상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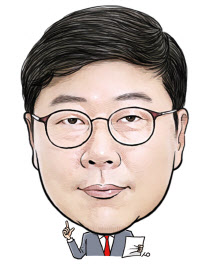






![[포토]포즈 취하는 팀테일러메이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134t.jpg)
![[포토]서울 올겨울 첫 한파특보… 내일 체감온도 영하 17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820t.jpg)

![[포토] 김혜수, 나홀로 화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074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734t.jpg)
![[포토]외환시장 점검 간담회, '발언하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653t.jpg)
![[포토]운영위 현안질의 불출석한 대통령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624t.jpg)
![[포토]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하는 김민석 최고위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518t.jpg)
![[포토]'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492t.jpg)
![[포토]설 앞두고 장보기 주저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700724t.jpg)
![[포토]홍재경 아나운서,론칭쇼 진행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22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