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거래가 익숙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증권거래세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었다.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투자자에게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기사(동아일보 1962년 9월27일 치)에 담긴 전언 투의 문장은 투자가들이 받았을 생경함을 대변한다. 결국 법은 9년 만에 사라졌다. 정부는 1971년 발표한 ‘세제개혁안’에서 이듬해부터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낮추고 자본거래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법이 다시 등장한 것은 1978년 무렵이다. 정부는 이듬해 시행을 목표로 ‘증권거래세법’ 신설을 추진했다. `양도차익에 당연히 세금을 물리는 과세형평 원칙이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게 명분이었다. 시장에서는 ‘투기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고,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부작용을 초래할 것’(매일경제 1978년 7월20일 치)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세금을 피하려는 돈이 증시에서 무섭게 빠져나갔다. ‘증권거래세 신설 시도에 투매가 이어져 증권시장에서 좋다는 주식이 모조리 박살 나는 판이라 여타주식은 말할 것도 없는 형편’(경향신문 1978년 9월8일 치)이었다. 갈 데를 잃은 돈은 지하경제로 흘러 ‘사채시장 이율이 떨어지는 이변’이 일었다. 놀란 정부는 법 제정을 유보하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도 했다.
대신 시행령에 ‘탄력세율’을 만들어 예외를 뒀다. 첫 시행령에는 △양도가액과 모집·매출가액이 액면가 이하이거나 △은행주 등은 거래세를 ‘0%’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 종금사 거래 세율은 0.3%로 정했다. 현행 시행령상 탄력세율(코스피 0.15%, 코스닥·코넥스 0.3%)과 견줘 대상과 정도가 다르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이 근거라서 정부 맘껏 주무르기가 가능했다. 정부는 법시행 직후 세율을 0.2%로 내렸고 증시안정화 대책이 나온 1990년 6월(0.2%)과 1995년 6월(0.45%)에도 인하한 적 있다. 1997년 환란 속에 치른 15대 대통령 선거 때 유력 후보가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분명히 법은 ‘거래세율 0.5%’였지만 무력했다. 법 밑에 시행령이라지만, 증권거래세 시행령은 법 위에 있었다.
그러나 시장 관심은 ‘시행령 조정’이 아니라, 오로지 ‘법 폐지’에 있었다. 법 제정 전부터 일었던 반발은 시행 이후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는다. ‘세금 탓에 주식거래를 꺼리면 자본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증시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그 과정의 첫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율 산정의 근거가 빈약하고, 선진국보다 세율이 높다는 지적도 줄곧 제기돼왔다. 정부는 앞서 그랬던 것처럼 시행령을 요리조리 고쳐 반발을 잠재우려 했다. 그러니 오늘날 `누더기 시행령`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마저 대증요법일 뿐이라서 법 폐지 요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시장 관점을 벗어나 접근하면, 증권거래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트집 잡힐 만하다. 처음 법을 제정한 1962년 당시 5대 국회는 5·16쿠데타로 해산한 뒤였다.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최고회의가 헌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법을 만들었다. 1978년 제정한 현행 법도 비슷하다. 그때 법을 만든 9대 국회는 유신헌법 지배를 받았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하던 때였고, 정부 의지가 법 제정으로 이어지던 시절이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20대 국회가 그때 그 법을 손보려고 현재 논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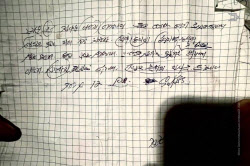




![[포토]크리스마스엔 스케이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45t.jpg)
![[포토]37번째 거리 성탄예배 열려 방한복·도시락으로 사랑 나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31t.jpg)
![[포토]조국혁신당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219t.jpg)
![[포토]우리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173t.jpg)
![[포토]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97t.jpg)
![[포토]즐거운 눈썰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79t.jpg)
![[포토]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인사말하는 이재연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633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506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8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