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대를 행복주택 5500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내 지구 지정, 내년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만만찮아 앞으로 사업승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고양 장항지구(예정지)는 비닐하우스와 영세한 공장 등이 즐비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수십 년 전부터 계획이 추진됐지만 여러 문제로 지금껏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정부가 이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정비해 새로운 도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는 임대주택 35% 이상을 포함해 공공주택을 50% 이상 지어야 한다. 위례·동탄신도시 등 모든 공공주택지구는 예외가 없다. 장항지구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약 7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은 민간에 땅을 매각해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를 달고 지을 계획이다. 자족시설용 부지도 15%다. 이는 위례나 동탄신도시 등 2~3% 수준에 불과한 다른 공공주택지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왜 반발할까. 이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과 교통 혼잡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행복주택에 대한 선입관 탓이 크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부유층이 밀집한 지역에선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행복주택을 우리 동네에 짓겠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영구·국민 임대주택에 비해 행복주택 선호도가 훨씬 높다해도 말이다. 이미 행복주택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관이 작용한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마케팅 부재도 거론하지 않을 수없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기만 했을 뿐 장항지구 개발의 필요성, 다른 장점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근 집값까지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유는 전체 부지의 30%를 산업·업무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내세운 성공적 홍보 마케팅 전략에 있었다. 아직 미분양인 땅이 수두룩하고, 임대주택이 50%를 넘는데도 말이다.
성공한 마곡지구와 달리 정부가 장항지구를 행복주택 공급 치적 쌓기로 활용하면서 결국 인근 주민들을 ‘님비’(지역 이기주의)로 몬 것은 아닌가. 수도권 서부 지역에 몰아넣기 식 행복주택 공급이 선입관을 키운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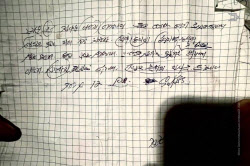




![[포토]우리 이웃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500173t.jpg)
![[포토]메리크리스마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97t.jpg)
![[포토]즐거운 눈썰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779t.jpg)
![[포토]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인사말하는 이재연 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633t.jpg)
![[포토]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506t.jpg)
![[포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 예정대로 진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433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87t.jpg)
![[포토]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권한대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400378t.jpg)
![[포토]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609t.jpg)
![[포토]인사청문회 출석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30040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