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서영걸 칼럼니스트] 오마이뉴스 권우성기자의 사진이다. 말 그대로 한잔의 녹조라떼를 권한다. 낄낄거린다. 그런데 아프다.
|
런던올림픽 관전으로 전 국민이 밤잠을 설치던 시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 ‘용역’과 ‘녹조라떼’. ‘용역’에 관한 기사들은 많이 못 보았을 수도 있으나, 녹조문제는 많이들 접했을 것이다. 특히 사진으로.
풍자와 상징. 예술의 영역에서 현상들 너머의 본질을 드러냄에 있어 즐겨 사용하는 주요한 두 가지 방법이다. 위 두 사진의 경우, 기존의 보도사진과는 사뭇 다른 깊이감이 있는 사진이다. 비틀기와 자르기는 허위와 왜곡과는 구별된다. 현실이 희극인데, 굳이 예술만은 진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녹색 물결 무늬 속에 배를 드러낸 물고기의 죽음은 우리의 미래를 암시하듯 하며, 커피전문점 컵에 담긴 먹음직한 녹색음료는 사실 죽음의 물임을 능첩스럽게 암시하며 우리를 압박한다.
“현대예술에는 <숭고>의 무거움과 그것을 파괴하는 <시뮬라크르>의 가벼움이 또한 존재한다.” 진중권의 현대미학강의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엄숙주의자들의 훈계는 지루하고, 자유주의자들의 행동은 경박스러워 보인다.
판에 박힌 사진들로 도배되던 한국 신문에서, 눈에 띄는 발랄함과 새로움을 개척하고 있는 사진들을 자주 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굳이 ‘한국적’-근원을 따지자면 일제시대의 영향이다-보도사진이라는 별종의 장르를 만들어, 창작의 즐거움을 거세시켜 버리는 우매함은 이제 그만 접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눈이 높아질데로 높아진 독자들을 따라 잡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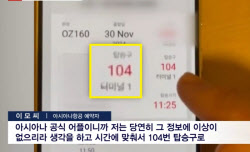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포토]최상목 "野 감액안 허술한 예산…무책임 단독 처리 깊은 유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44t.jpg)


![[단독]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1074b.jpg)

!["1.5억의 위용".. 강남에 뜬 '사이버트럭' 실물 영접기[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0940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