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 중 정부 지원 신청은 3만5000명뿐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 빚 탕감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달 말 현재 3만5000여 명으로 중간 집계됐다.
재단은 앞서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6개월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등에서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용 회복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대부업체·국민행복기금 등에 2007년 10월 31일 전에 발생한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이 있는 중위 소득(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저소득층이다.
|
이는 이전 박근혜 정부가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을 돕겠다며 같은 취지로 시행한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초기 신청 실적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 신용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금이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직접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출 상담 위탁 회사가 콜센터 업무 담당…재원 적어 사업 소극적
|
사정이 이렇지만 당국은 사업 부진의 원인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 홍보가 덜 됐거나 소득이 높아서 실제 자격 심사에서 걸러지는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이 작년부터 자율적으로 소멸시효(상법상 5년)가 지난 채권을 대거 소각했는데, 여기에 장기 소액 연체 채권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 공기업과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은 당국의 정책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 30조원어치(310만 명)를 추심이나 연장 없이 소각했다. 이때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 소액 연체 채권도 함께 정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과거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기금 출범식에 참석하고, 정부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설치해 운영할 만큼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지원 신청자 접수창구도 캠코, 서민금융센터뿐 아니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으로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은행과 업무 지원 협약을 맺는 자리에 참석하는 등 실무를 담당해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사업 재원 금융사 기부에 의존…적극 지원 어려워”
사업 재원이 부족한 것이 당국의 소극적인 정책 대응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에 들어가는 돈을 금융회사 출연이나 기부를 받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채무자에게 원금을 회수하면 이익을 다시 금융사에 돌려주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이 돈을 금융사에 주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 정리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빚 탕감에 국민 세금을 쓴다는 여론 질책을 피하기 위해 짜낸 방안이지만,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하다 보니 정부도 사업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정부 재정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면 된다”며 “정책에 확신이 없어서 은행 돈을 걷어 하는 둥 마는 둥 모양새만 갖추고 넘기려는 거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에 신청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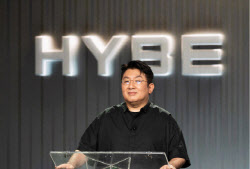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포토]이틀 연속 폭설에 눈 쌓인 북한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096t.jpg)
![[포토]서울리빙디자인페어 in 마곡](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081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