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패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변호사 최재천의 저서 ‘실패를 해낸다는 것’에 소개된 글이다. ‘유로 2004 예선전에서 잉글랜드가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감독은 팀 내 최고의 키커 베컴에게 킥을 맡겼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 본선 프랑스전에서도 베컴은 또 실패했다. 8강전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나선 베컴이 또 실축했다. 베컴은페널티킥 실패의 공포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대표팀 키커의 역할을 반납하고 말았다’
베컴, 그는 당대 최고의 선수였지만 페널티킥에서만큼은 실패의 과거를 통제하지 못했다. 인간은 반복적인 실패를 승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태원 사고를 보며 해석이 분분하다. 아마도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는 세월호 사고 때 초기 여론 대응 실패의 악몽을 떠 올릴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월호 대책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례는 해양경찰청 해체안일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은 이전의 독립조직으로 다시 돌아왔다. 조급함을 버리고 적정히 ‘과거를 통제’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영국의 역사학자 E.H.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비용과 조직, 인원을 들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축적하고 발전해온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태원 사고를 보며 어느 언론에서도 세월호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과 권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가 무엇이고 여러 차례 개최된 국회의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객관적 보도가 없는 점도 의아스럽다.
세월이 가면 변해야 함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 사회는 국가재난이나 인명사고를 당하면 지나치게 ‘인적 책임론’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만 봐도 그렇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한 상황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모든 것을 인적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전 근대적 사회의 모습이다.
디지털 강국을 자처해온 대한민국에서 전국에 촘촘한 디지털 모니터링이나 선제적인 지능형 예방시스템, 숙달된 훈련을 동반한 체계적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 참사가 있었을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현실을 바꾸는 세상이다. 혁신은 과거를 통제하고 미래를 받아들이려는 자세에서 나오고 이것이 이태원 사고를 돌아보는 첫 포인트이다.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하고 건강한 실패, 정직한 실패를 통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선진 사회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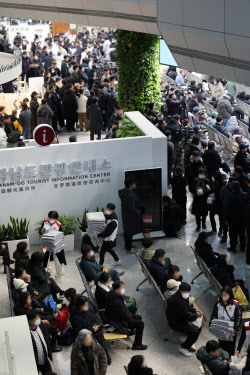





![[포토] 불길 휩싸인 여객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445t.jpg)
![[포토]출렁이는 환율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259t.jpg)
![[포토]겨울아 반가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232t.jpg)
![[포토]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095t.jpg)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 정청래 단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42t.jpg)
![[포토] 윤석열 법률대리인 헌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31t.jpg)
![[포토]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609t.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

!["우리 언니 살아있는 거 맞아요?"…통곡으로 가득 찬 무안공항[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900418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