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재판개입이라는 반헌법적 중범죄의 규명을 막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47·28기)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명재권(51·27기)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각각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서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도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와 함께 일부 범죄사실에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게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검찰은 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을 하급자에 지시하거나 직접 수행하고 이를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두 전직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관계를 통한 공모를 벌였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2차 회동’에 법원 측 대표로 참석해 청와대 및 외교부 등과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기존 판결내용 수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사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편법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옛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인 데다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해 영장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이 사건을 끝내려한다는 ‘꼬리 자르기’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소환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또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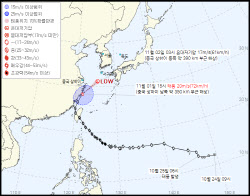




![[포토] 송민혁 '우승과 함께 신인왕을 노린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474t.jpg)
![[포토] 화사, 매력적인 자신감](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93t.jpg)
![[포토]이가영,부드러운 티샷 공략](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100330t.jpg)
![[포토] '트릭 오어 트릿' 진행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2211t.jpg)
![[포토] 송민혁 '이글 2개, 버디7개 잡은 날'](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152t.jpg)
![[포토]치솟던 배춧값 대폭 하락…"물량 충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70t.jpg)
![[포토]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익 4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369t.jpg)
![[포토]하모니카 연주가 이윤석의 연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230t.jpg)
![[포토]민통선 주민들 트랙터 시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1122t.jpg)
![[포토] 서울시예산안 설명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0/PS2410310089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