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케이블방송업계의 최근 화두는 단연 ‘인수·합병(M&A)’이다. 미국 최대 케이블업체인 컴캐스트는지난 2월 2위 사업자인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독과점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성사된다면 컴캐스트는 미국 유료방송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공룡사업자’가 된다.
한국 케이블방송시장도 마찬가지다. CJ헬로비전(037560)은 지난해부터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를 잇달아 인수하면서 케이블 1위 사업자로 우뚝 올라섰다. 티브로드 역시 몸집을 늘리면서 CJ헬로비전과 케이블방송 양대산맥을 구축하고 있다. 남은 개별 SO 11개사 역시 통폐합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 케이블방송업계 모두 케이블방송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IPTV, OTT서비스 등 신규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콘텐츠 사용료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수·합병은 성장을 위한 필수전략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케이블방송 박람회인 ‘2014 케이블쇼’의 첫 공식 세미나에서 로버트 마르쿠스 타임워너 케이블 회장은 “합병 여부를 결정할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국 SO인 서든링크 커뮤니케이션의 제럴드 켄트 대표는 “방송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금이 인수하기 위한 최고의 시기인 만큼 항상 새로운 인수대상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규모를 키우는 이유 중 하나는 지상파 방송사와 재전송 이슈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다. 케이블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자사 가입자에게 재전송하면서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미국 지상파 방송사 CBS와 케이블TV사업자 타임워너는 지난해 재송신 협상이 결렬돼 뉴욕, LA, 달라스 지역 타임워너 가입자들이 CBS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블랙아웃’이다. CBS가 전년보다 600% 인상된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했고, 타임워너는 과도한 사용료라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악수(惡手)였다. 가입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대체재인 통신사 및 위성의 방송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답을 찾은 게 케이블업체의 규모 확대다. 가입자를 늘리면 오히려 지상파가 케이블방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미국케이블TV방송통신협회(NCTA)의 스티브 에프로스 자문관은 케이블쇼 사전행사인 ‘한국의 날 세미나’에서 “타임워너가 CBS가 싸우다가 결국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통폐합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
국내 케이블업계는 대부분 대기업 자본으로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발언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상파 재송신 관련해 지상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는 올해부터 현재 케이블 가입자당 월 사용대가(CPS) 280원을 최소한 300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케이블방송사는 M&A마저 가로막히며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국내 지상파방송사는 법에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돼 있어 미국 상황과 다르다. CPS 책정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인 KBS2와 민·공영 특성을 모두 지닌 MBC, 민영방송 SBS에도 CPS를 내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빨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지상파가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FCC가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고 사업자 자율로 맡기고 있지만, 국내는 다른 상황인 만큼 CPS 협상 관련 정책결정자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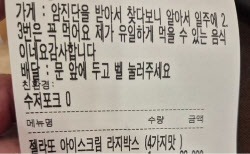




![[포토] 원·달러 환율 오를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849t.jpg)
![[포토] 폭설 피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76t.jpg)
![[포토]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경제계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547t.jpg)
![[포토]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자진 사퇴 생각 없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431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900370t.jpg)
![[포토]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송년회 무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622t.jpg)
![[포토]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공동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2801123t.jpg)
![강 건너고 짐도 나르고…‘다재다능’ 이상이의 무한변신 차는[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3000152h.jpg)


![선도지구 탈락 지역, 행정소송 가능할까?[똑똑한 부동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300012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