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제공] 19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前) 대통령 분향소에 70대 노인이 줄을 섰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 자택에서 버스를 타고 온 그는 손으로 이마를 훔쳤다. 땀으로 분홍색 셔츠가 붉게 젖었다. 노인은 20분쯤 차례를 기다려 국화꽃을 올렸다.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그러고 보니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못 드렸네요."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묵묵히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나왔다.
이열(70)씨는 마포경찰서 정보과 형사 신분으로 1976년부터 1996년까지 20년간 김 전 대통령을 전담했다. 김 전 대통령이 수시로 가택연금을 당한 1970년대부터 사형선고·투옥·망명을 거쳐 사면복권된 1987년까지 이씨는 매일 오전 9시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私邸)로 출근해 밤샘 근무를 하고 이튿날 오후 6시에 퇴근했다. 밤샘 근무는 사면복권 후에 없어졌다.
김 전 대통령 사저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던 요원들은 이씨 등 정예요원 4명을 포함해 30명쯤 됐다. 경찰은 사저의 양쪽 옆집과 앞집을 사들여 감시장소 겸 휴식처로 썼다. 요원들은 망원경을 들고 사저 안을 살폈다. 동네 복덕방 한 곳도 임차해 초소처럼 사용했다. 김 전 대통령이 외출하면 경찰차 두 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차 한 대가 기본으로 따라붙었다.
이희호(87) 여사가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장 보러 갈 때, 둘째아들 홍업(59)씨가 서점에 책 심부름을 갈 때…. 이씨 등 경찰들은 가족과 측근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시콜콜 감시했다.
이씨는 "이 여사가 두부 몇 모, 콩나물 몇 g을 사는지도 다 지켜보고 보고했다"며 "책 심부름은 홍업씨가 아버지가 사오라는 책 제목과 저자 이름을 알려줘서 수월했다"고 했다.
이씨의 고향은 충남 서천이다. 그가 처음 동교동에 배치됐을 때 중정 직원들이 "(김 전 대통령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의를 줬다. 김 전 대통령과 대화하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금기였다.
이씨는 "마포경찰서 서장님도 김 전 대통령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중정 직원을 대동한 채 사저에 들어가 '말'이 아닌 '글'로 의사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서장이 종이에 '오후에 집회가 있는데, 그곳에 참석하시면 위법이오니 참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같은 문구를 적어서, 마주 앉은 김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식이었다.
"이 여사가 과일을 내오시곤 했어요. 중정 직원들이 못 먹게 해서 입에 댄 적은 없지요. 친하게 지내는 표를 내면 혼이 났어요."
이씨는 "그래도 석 달쯤 지나면서부터 김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을 대할 때 인사를 주고받게 됐다"고 했다. 나중에는 측근들이 사저에 드나드는 길에 이씨에게 들러서 "연금생활이 힘들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하루는 집 앞에서 이 여사와 마주쳤어요. 제가 웃으며 인사하니까 '이 형사님, 왜 이리 웃음이 많으세요. 웃지 마세요. 중정 직원이 저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하고 놀렸어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죠, 하하."
"뒤에서 중정 직원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요. 그 현장이 걸렸다면, 어휴…."
가택연금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온종일 책을 읽었다. 이발사 출입을 통제했을 때는 혼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잘랐다. 하루에 한두 번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고, 키우던 개와 놀아줬다.
20년간 김 전 대통령을 지척에서 지켜봤지만 이씨는 김 전 대통령과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다. 눈을 똑바로 마주친 것도 단 한 번뿐이었다.
"70년대 말에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의사도 들여보내지 않은 적이 있어요. 이 여사가 앓아누웠는데 중정에서 '동향을 파악해오라'고 해서 사저에 들어갔어요. 이 여사가 초주검이 돼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김 전 대통령과 마주쳤는데,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시더군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씨는 1996년 정년퇴직하면서 동교동을 떠났다. 이듬해 겨울, 대선에 승리한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 이씨를 초대했다.
이씨는 1997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회고록 '김대중 보고서'를 펴냈다. 이 여사가 수행원을 보내 책 5권을 사갔다. 이씨는 목멘 소리로 "자신을 감시한 사람인데, 책값으로 책의 원래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일봉'을 주셨다"고 했다. 그는 금일봉 액수를 밝히지 않고 분향소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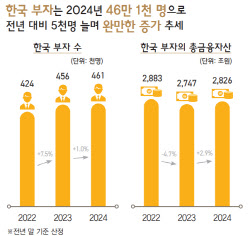



![[포토]'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좋아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768t.jpg)
![[포토] 나인퍼레이드 캠페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496t.jpg)
![[포토]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000232t.jpg)

![[포토]영화 속 배경에서 찰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1369t.jpg)
![[포토] 아수라장된 기자회견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1115t.jpg)
![[포토]다양한 식음료가 한 자리에, '컬리 푸드페스타 2024'](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958t.jpg)
![[포토]2025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743t.jpg)
![[포토]북적이는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708t.jpg)
![[포토] 미소짓는 오세훈 서울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1900574t.jpg)

![[포토]안소현-김성태 본부장,취약계증 후원금 전달식 진행](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1400036h.jpg)


![[속보]민주당, 韓대행 특검법 공포 시한 24일로 결정](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200149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