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사건의 범인들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은 2017년 5월 대대적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과 치료의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했는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원을 통한 치료보다는 사회에서의 치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기존 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 있으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입원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안인득 역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였으나 강제입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치료를 받지 않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유일한 법적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는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나마 병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던 형은 동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를 입원 시킬 수 없었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입원을 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 기존에 강제입원 제도를 가족간 갈등에 악용하거나 전문의와 짜고 강제입원 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기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개정 법의 취지를 수긍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한 정신의학과 의사는 ‘환자에게는 치료가 인권’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도외시한 법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해 사회에 복귀시키고, 사회적 편견 없이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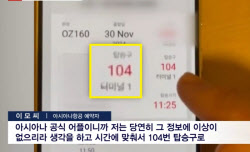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포토]최상목 "野 감액안 허술한 예산…무책임 단독 처리 깊은 유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44t.jpg)


![[단독]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1074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