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지원 율촌 상임고문은 노동만 30여년을 들여다본 전문가다.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만 28년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해왔다. 왜 하필 노동이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행정은 따뜻하면서 냉정하게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부처별로 고유한 행정 대상이 있는데, 노동은 행정대상이 사물이 아닌 ‘일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데 매력을 느꼈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 | 정지원 율촌 상임고문이 2023 이데일리 전략포럼 연사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
그는 고용부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고용서비스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 노동 관료라면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1년에는 대변인을 맡아 기자들과 소통하며 기자들이 뽑은 최고의 대변인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꽃길만 걷던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근로기준정책관을 지내며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양대 지침 마련에 참여했다. 이 일은 새 정부에서 낙인이 됐고 결국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당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공직이 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뛰어난 후배들이 노동 정책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율촌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노동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CEO부터 근로자까지 더욱 다양한 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며 이전에 몰랐던 것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에 공직에 있을 땐 탁상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서 했던 정책을 보면 현장과 동떨어진 것들이 있어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엔 정책은 보편타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원 솔루션’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현장과는 너무 먼 해법이 되고 말았다. 그는 후배 공무원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하나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렸으면 좋겠다. 해법이 2~3개가 있으면 어떤가? 누구를 더 봐주고 덜 봐주는 게 아닌, 현장 당사자가 만족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잘 만들겠다는 집착보다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활용하게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한편 정지원 상임고문은 오는 6월 21일과 2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연사로 나선다. 일본 노동경제학자인 겐조 에이코 아시아대 교수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출구가 꽉 막힌 노동개혁의 해법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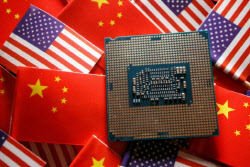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단독]'세계 꼴찌' 코스닥 개혁 시동…1·2부로 나눠 경쟁](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300016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