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화 드라마트루그] 설유진 연출의 ‘이런 밤, 들 가운데서’(극단 907, 두산아트스페이스 111)는 지난해 11월 말에 공연했다. 그러니 이 글은 이미 지난 공연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리고 다시 보고자 하는, 말 그대로의 리뷰다.
 | | 연극 ‘이런 밤, 들 가운데서’ 공연 사진.(사진=ⓒ박태준) |
|
다섯 명의 배우가 관객과 같이 빙 둘러앉아 시작하는 ‘이런 밤, 들 가운데서’는 이곳이 극장임을 알리며 막을 연다. 극장 공간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한 후에 자신들을 소개하고 시작하겠다는 선언으로 극은 다시 시작한다. 극장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공간이지만, 사실 단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데 모이는 공간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꽤 낯설고 드문 곳이다. 극장의 존재가 너무나 익숙했던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극장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강제로 얻었다. 이렇게 쓸모없으면서 꼭 필요한 공간이었다니. 지난 3년간 극장은 그곳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렇게 쉽게 사라질 공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태롭게 필사적으로 만났었는지를 깨달은 시기였다.
공연은 헤어진 연인들, 동물원에서 도망친 앵무새와 뻐꾸기, 그리고 옆집 할머니를 방문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엇갈려 이야기한다. 이야기 안에서 이름과 의미가 만나고, 다른 이야기가 겹친다.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우던 배우들이 멱살을 붙잡고 몸이 겹치고, 솟아오른 무대를 벗어나 극장을 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와 환상의 어느 공간을, 그리고 무대와 객석을 겹친다. 이야기는 그렇게 점점 더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 끝의 시작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고 이야기는 끝을 낸다. 이 공연에서 겹치는 일은 이렇게 여러 번 일어나고 되풀이된다. 마치 나선을 그리며 가운데로 향하는 동심원처럼 이야기는 점점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 수어로 지금 하는 공연을 통역하거나 자막으로 배우들이 지금 발화하는 대사를 무대에 투사하는 일, 배우들이 연기하는 연극의 공간이 관객의 눈앞에서 겹친다. 공연의 의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확장하고, 그 의미 사이에서 새로운 연극성을 만들어 내듯이 말이다.
 | | 연극 ‘이런 밤, 들가운데서’ 공연 사진.(사진=ⓒ박태준) |
|
소통의 새로운 의미를 쓰거나 정립해 내는 공연이 아니다. 실패한 소통과 절망, 그리고 그때 물어보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한다. 힘들었던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지 않았던 죄책감과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모든 일을 그저 바라보기밖에 할 수 없던 외로움과 죄책감을 이야기하려는 불완전한, 완전하게 되지 않으려는 시도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소통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인다고 말하는 공연이다.
의미는 언제나 불완전하게 전달된다. 그 불완전한 전달로 소통은 언제나 안타깝고 애매하다. 이렇게 애매하고 안타까운 소통으로 무대는 관객으로 나아간다. 배우들이 가운데 솟아오른 작은 무대를 벗어나 극장을 돌며 춤출 때 관객은 그 안에 앉은 배우가 된다. 그저 바라보는 행위가 바로 가장 적극적으로 듣는 행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들을 때 이야기는 관객한테로 온다. 보는 마음에 대한 공연이자 소통에 대한 고민이고, 그 모든 고민을 들어주는 공연이다. 이런 공연을 추워지기 시작하는 겨울의 초입에 들었다. 그저 바라만봤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 행복한 공연이었다.
 | | 연극 ‘이런 밤, 들가운데서’ 공연 사진.(사진=ⓒ박태준) |
|
 | | 연극 ‘이런 밤, 들가운데서’ 공연 사진.(사진=ⓒ박태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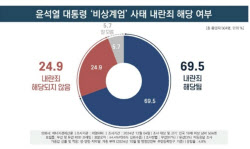




![[포토]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534t.jpg)
![[포토]서울 지하철, '계엄 파문 속' 3년 연속 파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82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79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32t.jpg)
![[포토]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지역주민위한 공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127t.jpg)
![[포토]국회 월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332t.jpg)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