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성 목사는 지난해 12월 지구촌사랑나눔 홈페이지에 ‘절망편지’ 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서신을 띄웠다. 그는 지난 1992년 외국인과 중국동포 상담을 시작해 현재는 이들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의 비영리민간단체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민간차원에서만 외국인 지원을 감당하는 게 역부족인 현실을 지적했다. 이 편지를 띄운 당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이하 외국인 노동자)는 150만 명을 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71만 명이다. 이들이 우리 삶에 성큼 다가온 지금, 그의 편지는 흘려보내기엔 묵직한 ‘묵시록’처럼 느껴진다.
그동안 국내 이민정책은 ‘외국인 정착’보다는 ‘선택과 배제’ 원칙에 충실했다. 이민정책을 출입국, 체류자격을 다루는 ‘이민관리’와 정착 및 적응지원을 다루는 ‘사회통합’으로 분류하자면, 우리는 불법체류자를 쫓아내는 이민관리 정책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여성가족부)에 집중해왔다. 그러다 보니 국내 체류 중인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은 ‘사각지대’로 남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최근 들어 이런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중 중국동포는 57만 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12만 여명을 비롯해 태국·필리핀·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각각 4만~7만 명에 달했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수여서 민간 후원금으로만 외국인 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김 목사의 판단이다. 도움을 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늘어나는데 재정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 목사가 매일 마주하는 불안한 현실은 위태롭기까지하다.
하지만 국부유출 논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퍼주기·역차별 정서가 있고 양극화까지 심한 현실에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착·지원정책을 선뜻 꺼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오원춘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 우려까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이민자를 돕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설문에 응답자 37.5%가 동의했고 ‘외국인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응답에는 과반(53.0%) 이상이 찬성했다.
정부의 ‘속앓이’도 깊어가고 있다. 출입국 관리 차원으로만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장 9년 8개월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출입국관리소측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쏟아지는 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출국시키는 것이 앞으로 불가능할 텐데, 정착화 정책을 고민할지, 출국 기준을 새로 세울 지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국민 정서,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이민은 ‘피할 수 없는 독배’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라며 “이민관리를 국익 차원에서 엄격하게 하되, 이민조건을 충족하면 자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은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인구 인프라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국제적인 스펙트럼으로 현실을 보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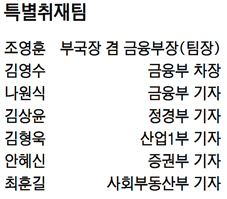






![[포토]구름 사이로 보이는 2025년 첫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100163t.jpg)
![[포토]여객기 사고 합동 참배 마친 우원식-이재명-권영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3100548t.jpg)
![[포토] 미세먼지 '나쁨' 주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3000567t.jpg)
![[포토] 불길 휩싸인 여객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445t.jpg)
![[포토]출렁이는 환율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259t.jpg)
![[포토]겨울아 반가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232t.jpg)
![[포토]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095t.jpg)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
![[대한민국 새판 짜기]37년 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100061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