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재계의 화두는 5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170개 회원국) 주관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유치전이다. 정부와 재계에선 지난해 유치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기울었던 무게추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쏠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관 합동으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엑스포 개최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상당해서다. 개최 비용은 5조원가량이지만 생산유발과 부가가치는 각각 43조원, 18조원에 이를 정도다. 엑스포가 경제·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엑스포 유치는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올림픽, 월드컵을 포함한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로 기록되면서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재계 안팎에선 엑스포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을 표한다.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식음료까지 안오른게 없을 정도로 물가가 뛰다보니 당장 여론을 형성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먹고사는 문제도 급하지만 정치권의 지리한 정쟁 또한 현안을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당장 오는 4월중에는 BIE 사무국 인사로 구성된 실사단이 일주일간 방한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후 실사단이 작성·공개하는 실사 보고서는 회원국들에게 일부 의사결정의 잣대로 작용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투표 막판에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와의 접전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정(政)·관(官)·민(民)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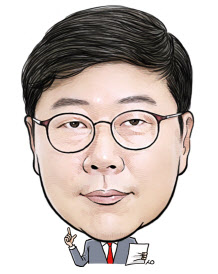





![[포토]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000886t.jpg)
![[포토]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10일 운영 종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000832t.jpg)
![[포토]박종준 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000511t.jpg)
![[포토] 맘스홀릭베이비페어 전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1108t.jpg)
![[포토]수도권 첫 한파주의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1027t.jpg)
![[포토]'무죄'받고 이동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98t.jpg)
![[포토]기자회견 하는 김상욱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87t.jpg)
![[포토]전국정당을 넘어 K-정당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948t.jpg)
![[포토]발언하는 권영세 위원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900599t.jpg)
![[포토]포즈 취하는 팀테일러메이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0800134t.jpg)

![[포토]홍재경 아나운서,론칭쇼 진행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080022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