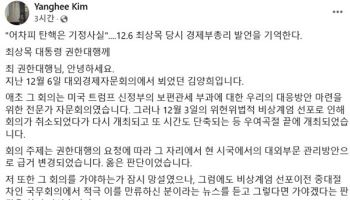그런 상황에서도 수십년간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 바로 아파트 선(先)분양 제도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먼저 분양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무릇 수명이 긴 제도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게 마련이다. 선분양 역시 그렇다. 공급자(건설회사)는 공사 비용을 수요자(소비자)에게 미리 받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수요자에게도 선분양은 매력적일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을 공정에 맞춰 나눠 내면 되기 때문에 입주 때 한꺼번에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택업체의 신용으로 저리 또는 무이자 중도금 대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분양 제도가 한때 시장과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호황기였던 2000년대 중반 건설업계가 선분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건설회사 배만 불린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던 것이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발표한 5·2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아파트에 우선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다 지은 뒤 파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랬던 후분양 제도가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선분양 대신 보증 등 금융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분양 전 또는 미분양 상태인 물량을 대상으로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아파트 분양시점으로 준공을 미루면 분양대금을 대신할 건설자금을 낮은 이율로 빌리더라도 금융비용에 따른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또 준공 이후에도 분양에 실패할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리스크도 떠안야한다.
선분양과 후분양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된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특정 제도가 자리잡게 내버려두는 게 좋다는 얘기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시장 개입은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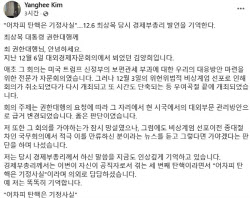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 정청래 단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42t.jpg)
![[포토] 윤석열 법률대리인 헌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31t.jpg)
![[포토]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609t.jpg)
![[포토]입장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46t.jpg)
![[포토] 달려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515t.jpg)
![[포토]이재명 "한덕수·국민의힘 내란 비호세력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 추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363t.jpg)
![45년간 자리 지킨 ‘포프모빌’…전기차로 바뀌었다는데[누구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800166h.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