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조그만 비누회사로 출발해 질풍노도의 고성장 가도를 달린 후 외환위기의 격랑 속에서 해체된 쌍용그룹. 계열사마다 인수·합병·청산 등 비운의 길을 걸었지만 자동차의 여정은 특히 험난했다. 미래를 향해 달리기는커녕 홀로서기도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면서 걸핏하면 주인이 바뀌었다. 대우그룹 울타리 안에서 숨을 돌리나 했더니(1998년) 중국 상하이차로 넘어갔다가(2005년) 인도 마힌드라로 손바뀜한(2010년) 후 최근 KG그룹의 가족사가 된 쌍용자동차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회사의 굴곡진 운명은 상하이차 시절(2009년)과 마힌드라 시절(2020년)각각 한 차례씩 법원의 결정(기업회생절차)에 앞날을 맡겨야 했던 과거사에 진하게 녹아 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근로자들이 벌인 2009년 5~8월 77일간의 옥쇄 파업은 오랜 아픔으로 남아 있다. 사람으로 치면 천신만고의 풍파를 겪은 후 이제 새 주인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선 셈이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질주는 가능할까. 해답의 열쇠 중 하나는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기술력 DNA가 첫째 단서다.
하지만 막강한 자금력과 거미줄 판매망을 갖춘 대형사들의 진입과 유사 차종간 무한 경쟁은 쌍용을 줄곧 먹구름 속으로 밀어 넣었다. 쓰나미처럼 몰려온 도전을 뿌리치는 데에는 기술력 하나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기술 유출 논란 속에서 이 회사를 사들였던 외국 자본들이 대규모 추가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먹튀’ 시비와 노사 분규 등 구설수만 남긴 채 손을 들고 만 것은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201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22분기 연속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부실기업 오명을 달고 다닌 옛 상처가 안타까울 뿐이다.
용의 승천에는 여의주가 필수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비상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노사의 하나 된 마음과 산업 현장의 평화일 것이라고 나는 꼽고 싶다. “자식들에게 작업복이 가장 귀한 옷이라고 말해 왔다”는 한 직원의 말이 최근 매스컴을 탔지만 산업 현장의 장인들에게 작업복은 회사와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갑옷’이다. 작업복의 가치와 의미를 누구보다 절감했을 임직원들의 얼굴과 가슴에 미소와 훈장이 가득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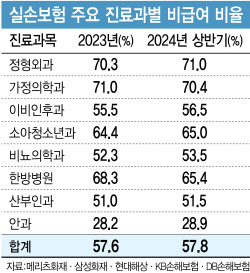




![[포토]박도영,최종일 승리의 브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0152t.jpg)
![[포토]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0253t.jpg)
![[포토] 소방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큰 불 신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60t.jpg)
![[포토] 이대한 '2024시즌 대미를 장식하며 동료들과 함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14t.jpg)
![[포토]의협 대의원총회 참석하는 임현택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95t.jpg)
![[포토]잠시 쉬어가는 서울야외도서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81t.jpg)
![[포토]‘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59t.jpg)
![[포토]정부, ‘비위 혐의 다수 발견’ 이기흥 체육회장 등 경찰 수사 의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27t.jpg)
![[포토]수능대박을 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02t.jpg)
![[포토]가을의 추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165t.jpg)

![[포토]박보겸,버디 후 집중한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100179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