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인 신한은행과의 만남에 권 대표는 그날 이니텍에 첫 출근한 영업팀장과 함께 갔다. 하지만 신한은행 담당자는 이들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영업팀장이 한 시간 반 동안 전산실 벽에 붙어서서 기다린 결과 은행 담당자가 말을 걸어왔다. 그제서야 제품을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마침내 신한은행 수주에 성공했다. 그 뒤로 제일은행, 한미은행 등 수주가 이어졌다. 2001년 상장 당시 이니텍의 솔루션은 국내 인터넷뱅킹 시장의 60%를 차지했다.
“그때 만일 그 친구를 신한은행 미팅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 친구가 일찌감치 포기하고 한 시간반 동안 기다리지 않았다면, 이니텍, 이니시스는 물론 지금의 권도균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영업팀장은 오랫동안 이니텍에 머물면서 2008년 리노스에 매각될 때까지 임원으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연 매출 508억 원을 기록한 이니텍과 4157억 원을 기록한 이니시스에 한 은행의 수주는 큰 건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작은 성공에 불과하다. 하지만 권 대표는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작은 성공들이 연결돼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성공한 창업자들도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기억은 변질되기 때문에 왜 성공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가다보면 작은 사건의 성공이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나비효과와 비슷하죠.”
|
권 대표는 1997년까지 데이콤 종합연구소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다. 이미 결혼한 지 4년 차에 큰 아이가 4살, 작은 아이가 부인 뱃속에 있을 때였다. 가장으로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시기였지만 권 대표는 과감히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당시 권 대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봤지만, 빚만 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망하더라도 프로그래머로 어느 회사든 다시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보니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퇴직금과 전세금을 모으고 데이콤에서 받은 우리사주를 팔아 약 1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 1997년 보안업체 이니텍을, 1998년 전자지불업체 이니시스를 설립했다. 권 대표는 1994년 인터넷을 처음 접한 후 전자상거래와 전자지불 인프라에 관심이 생겼다. 당시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가 막 시작하던 단계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셋(SET)’이라는 전자지불 기술이 표준처럼 사용됐다. 하지만 권 대표는 이 기술은 너무 무겁고 복잡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편리하면서도 보안성이 높은 전자지불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니시스의 ‘이니페이(INIpay)’ 서비스다. 이 기술은 2001년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면서 지금도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밥 해주는 아주머니에게도 스톡옵션 부여
이니텍과 이니시스를 운영하면서 권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밥’이었다. 권 대표는 창업 초창기인 1997년 직원이 7명일 때부터 밥하는 아주머니를 고용했다. 오전 내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전기밥솥 돌아가는 소리와 밥 냄새를 맡는 것이 좋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의 테이블 위에 음식을 펼쳐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었다. 창업 초기엔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못 주지만 밥만큼은 회사에서 주자는 생각이었다.
이니텍과 이니시스의 코스닥 상장 전까지인 약 4년간 직원들은 함께 밥을 먹었다. 직원이 100명이 넘어갈 때는 시간을 세 타임으로 나눠서 먹기도 했다. 이니텍과 이니시스는 건물이 달랐지만 식사시간만큼은 직원 구분이 없었고 개발직, 영업직 등 부서에 관계없이 같이 식사를 하다보니 교류도 활발했다.
권 대표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음식을 해주시던 아주머니도 똑같은 직원으로 여겼다. 이니텍과 이니시스의 코스닥 상장 시 직원의 근속 년수, 직급에 따라 스톡옵션을 배정했는데 아주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톡옵션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주머니는 상장 1년 후 적지 않은 돈을 벌게됐다.
구글이 직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안마사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직원 복지가 좋은 최고의 직장을 꼽히고 있다. 권 대표는 구글보다 먼저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이다.
|
권 대표는 잘 나가던 이니텍과 이니시스를 2008년 떠났다. 주변에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자신보다는 경영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창업할 때의 열정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임직원이 1000명에 다가가면서 회사 경영에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위에 기사와 비서가 있어 전화 한통이면 해결이 되는 일이 많아졌고 시시각각 보고를 하는 임원들이 있었다. 회사를 굳이 출근하지 않더라고 편하게 많은 봉급을 가져갈 수 있는 ‘황제경영’이 가능한 시점이 서서히 다가왔다.
“점차 몸은 편해졌지만 스스로 나의 미래를 상상했을 때 그다지 존경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운전사도 없고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는 등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욱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업체 프라이머를 세운 이후 권 대표는 대부분 시간을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 멘토링을 하는데 보낸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내는 멘토링은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권 대표는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해야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투자자들이 좋은 스타트업을 고르듯이 스타트업들도 좋은 조언을 얻기 위해 멘토를 평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속적으로 업계의 감을 잃지 않아야 스타트업들에게 제대로 된 지식과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창업자들은 드라마틱한 성공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하나의 계기로 급작스럽게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꿀벌이 조금씩 꿀을 모아 하나의 벌집을 만들듯이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작은 성공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머를 만든 것도 스타트업들에게 헛된 성공담을 들려주기보다는 올바른 성공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1963년생으로 청구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전산학과 학사를 졸업했다.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데이콤 종합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1997년에 보안업체 이니텍, 1998년 전자지불업체 이니시스를 설립해 2000년대 초반 두 회사를 모두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2008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오다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올라 1년 동안 미국 UC버클리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2009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와 2010년 스타트업에 엔젤투자자와 멘토링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를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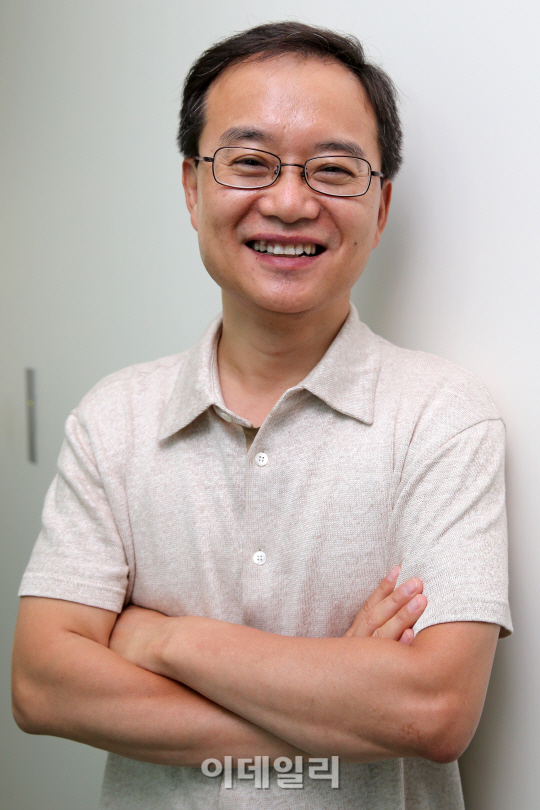






![[포토]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678t.jpg)
![[포토] 코스피, 코스닥 내림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243t.jpg)
![[포토]'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로 이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58t.jpg)
![[포토] 네스프레소 2025 캠페인 론칭 토크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14t.jpg)
![[포토] '와일드무어' 미디어 행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1005t.jpg)
![[포토]공수처 차고로 들어가는 윤 대통령 차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861t.jpg)
![[포토]사다리로 차벽 넘는 공수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701t.jpg)
![[포토]공개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500422t.jpg)
![[포토]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신규채용 2만4000명 추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899t.jpg)
![[포토] 설 명절 자금 방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01/PS25011400672t.jpg)
![[포토]박현경,백여 명의 팬들과 즐거운 출정식 개최](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200149h.jpg)



![[단독]尹 16일 헌재 출석하려 했다…"변론권 보장 못받게 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01/PS25011501489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