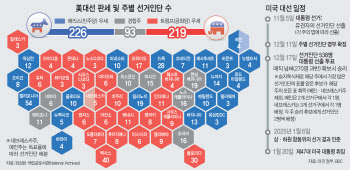키코는 은행이 지난 2007~2008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한 파생 금융 상품이다. 하락하던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치솟으면서 기업 1000여 개가 손해를 입고 300여 개가 폐업과 부도를 맞는 등 부실화했다. 문제는 법원이 키코 사태를 이미 오래전에 매듭지었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소송 4건을 다루며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키코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 위험을 회피하는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다. 검찰도 이보다 앞선 2011년 키코를 판매한 은행 11개를 무혐의 처분했다.
금융 소비자 눈물을 닦겠다는 윤 원장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1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속이 까맣게 탄 피해 기업인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일부 피해 보상 정도로 만족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금감원이 키코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기 상품’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뒤집는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금감원은 과거 사건 재조사가 미칠 파장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포토]평생당원 초청 간담회 참석하는 한동훈 당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858t.jpg)
![[포토] 세계최초 8K 온디바이스 AI TV](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97t.jpg)
![[포토]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투명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57t.jpg)
![[포토]패딩이 필요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47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500637t.jpg)
![[포토] 훈련장 이동하는 '시니어 아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1152t.jpg)
![[포토] 오세훈 시장과 김병주 MBK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60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947t.jpg)
![[포토]SK AI 서밋 부스 살펴보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862t.jpg)
![[포토]수능 D-10](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794t.jpg)

![[포토]마다솜,빛나는 트로피와 금메달](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4003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