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국민들이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건 '저축은행이란 곳이 참 믿을 게 못되는구나'라는 인식일 것이다. 앞서 두차례 청소를 했으니 나아졌으려니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먼지는 물론 세균에 악취까지 풍겼다. 저축은행 회장이 사기꾼에 신용불량자였고, 문화재급 고택에 숨긴 수십억대 비자금을 친구에게 털리고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등 한편의 조폭 영화를 보는 듯 하다.
엎질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는 없다. 고객 돈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파렴치를 처벌한다 해도 저축은행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천착해야 할 대목은 우리나라 서민금융이 어디쯤 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상호신용금고에 ‘은행’ 간판을 걸도록 허용하고,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린 건 저축은행을 키워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저축은행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형사들이 덩치를 키웠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도 앞다퉈 뛰어들었다. 자산규모가 지방은행을 뛰어넘은 대형 저축은행들도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역임한 A씨는 "저축은행들이 마치 은행이 된 것 처럼 착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몇푼 되지도 않는 돈을 들고 와서 금리 따지는 시장 상인들은 귀찮은 고객이 됐다. 은행 PB(Private Banking)센터 처럼 저축은행들도 영업점을 호화롭게 꾸며 VIP와 큰손들을 모셨다. 여신심사 능력이 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굴릴 곳은 많았다. 저축은행이 이처럼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면서 서민금융도 함께 실종돼 갔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사채업자에게 시달려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파탄난 비극의 주인공은 대부분 서민들이다. 급전이 필요한데 모아둔 돈은 없고, 은행 문턱을 넘기엔 신용이 낮다. 이렇게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대학생, 청년 백수들이 사금융의 제물이 됐다. 수만 건씩 쏟아진 피해신고 사례는 사금융이 물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쳤다는 증거다. 한편으론 서민금융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도 서민금융에 공을 들였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이름은 화려하다. 그런데 공허하다. 핵심을 빼놓고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를 잘 풀어가려면 핵심 포스트가 제 몫을 하고, 주변이 핵심을 받쳐줘야 한다. 서민금융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서민금융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신뢰를 잃은 현재의 저축은행으론 안된다. 과도하게 풀어놓은 규제는 다시 조이고, 필요하다면 이름을 바꿔서라도 제 기능을 되찾게 해야 한다. 정부도 고만고만한 서민금융 상품으로 생색내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이들 상품의 재원을 다 합하면 5조원쯤 된다고 한다. 이런 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해 옥석을 확실히 가려주고,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금융소외자들이 악덕사채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금융이 산다.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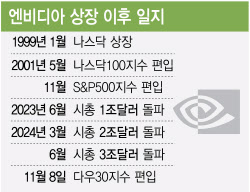




![[포토] 소방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큰 불 신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60t.jpg)
![[포토] 이대한 '2024시즌 대미를 장식하며 동료들과 함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314t.jpg)
![[포토]의협 대의원총회 참석하는 임현택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95t.jpg)
![[포토]잠시 쉬어가는 서울야외도서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81t.jpg)
![[포토]‘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59t.jpg)
![[포토]정부, ‘비위 혐의 다수 발견’ 이기흥 체육회장 등 경찰 수사 의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27t.jpg)
![[포토]수능대박을 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202t.jpg)
![[포토]가을의 추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000165t.jpg)
![[포토]이보미,오랜만에 쉽지않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900387t.jpg)
![[포토] 이대한 '오늘 홀인원 한 볼입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0900174t.jpg)

![[포토] 이대한 '2024시즌 대미를 장식하며 동료들과 함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000314h.jpg)
![트럼프 전용기 옆자리 그녀…유리천장 깨고 오른팔 등극[파워人스토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1/PS24111000432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