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교수와의 관계, 학업 등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대학원생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잇단 잔혹사에 또래 대학원생들은 그 심정을 이해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불투명한 진로, 불안정한 지위, 과도한 경쟁, 교수·제자 간의 ‘갑을 관계’ 등 정신적 압박이 크다는 것이다.
 | | 서울 동작구 위치한 숭실대(사진=페이스북) |
|
숭실대 소속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하는 학부생들의 인솔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교수로부터 “바보냐” , “너 때문에 망쳤다” 등의 고성 섞인 폭언을 들었다. 자책한 A씨는 귀국한 뒤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수의 책임 논란이 불거지며 학교에선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숭실대는 지난해 11월 교수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가 학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안 죽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숭실대는 지난 5일 입장문를 내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원생의 극단 선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학원생 B씨가 서울대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는 ‘공부가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가 서울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재학 중 폭언·욕설을 들었다’는 비중은 15.6%, ‘재학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응답자는 무려 22.6%에 달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학원생들 사이에선 최근 벌어진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서울대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김모(27)씨는 “교수가 ‘절대 갑(甲)’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부담감을 느끼고 상처받기 쉽다”며 “실적이 안 좋아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은 자대생 타대생이 다 섞여 있고 경쟁도 심해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연구실 특성상 갇혀 생활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교수의 갑질이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이뤄졌다면, 요즘에는 연구에서 제외하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식으로 ‘암묵적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고려대 공학계열 대학원생 윤모 씨(32)는 “이런 경우는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학생들은 “어떻게든 버텨볼 것”이라며 내저었다. 한양대 공학계열 대학원생 전모(27)씨는 “학위를 따지도 못하고 대학원 생활에 들어간 돈과 시간,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며 “회사는 관둬도 경력이 남지만 자퇴는 마이너스 뿐이다. 패배자 인생”이라고 했다.
교수를 견제할 수 있는 수평적 시스템이 마련된 미국 등 외국 대학과 달리, 한국 대학은 교수 개인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대학원생노조 측은 “불안정한 법적 사회적 지위에서 앎을 생산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는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라며 “대학원생의 오랜 공부는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안에 전문적 지식이 생산·유통·축적되는 과정의 대우는 없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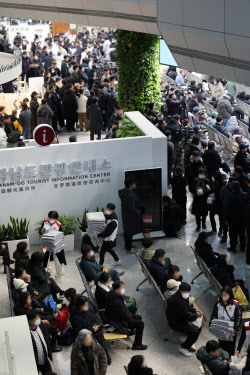





![[포토] 불길 휩싸인 여객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445t.jpg)
![[포토]출렁이는 환율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259t.jpg)
![[포토]겨울아 반가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232t.jpg)
![[포토]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900095t.jpg)
![[포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978t.jpg)
![[포토] 달러 상승 이어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871t.jpg)
![[포토] 헌법재판소 소심판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60t.jpg)
![[포토] 정청래 단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42t.jpg)
![[포토] 윤석열 법률대리인 헌재 출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731t.jpg)
![[포토]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2700609t.jpg)
![[포토]윤이나,후배 양성을 위해 2억원 기부했어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600088h.jpg)

!["우리 언니 살아있는 거 맞아요?"…통곡으로 가득 찬 무안공항[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2900418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