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26% 수준을 유지하던 SK텔레콤(017670)의 피처폰 판매비율은 이달들어 15%까지 떨어졌다. KT(030200)는 같은 기간 31.6%에서 22.3%로, LG유플러스(032640)는 18.8%에서 7.8%로 급감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판매한 100대중 92대는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다. 통신 3사 모두 판매대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009년 89%에 달했던 피처폰 판매비율은 2010년 6월 SK텔레콤이 갤럭시S를 단독 출시하면서 75%로 주저앉았으며 연말에는 43%로 감소했다.
매장에서 피처폰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이유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때문이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수익성 높은 스마트폰 판매에 열중하고 있고 `얼리어답터`가 넘쳐나는 국내 이동전화 이용자들 또한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갈아타고 있다.
특히 롱텀에볼루션(LTE)의 등장이 피처폰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사활을 걸고 가입자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LTE는 데이터 서비스만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이다. LTE폰의 음성통화는 아직까지 3G망을 이용한다.
제조사 또한 스마트폰이 피처폰보다 단가가 높고 마진폭이 커 매력적이다. 제조사들은 아이폰의 등장 이후 히트 단말기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일반화되자 라인업을 단순화하고 `간판` 스마트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싱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 출시되는 피처폰이 가뭄에 콩나듯 한다. 드물게 출시된 피처폰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와이즈2`는 피처폰 사용자들을 타깃으로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놓은 야심작이다. 그러나 판매량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40~50대 피처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역시 스마트폰이 트랜드나 디자인에서 앞선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낮은 요금 등 경제적인 이유로 피처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스마트폰 요금제 약정 못 채우면 위약금 낸다 ☞통신株, 정기예금 이자 2배 챙길 수 있는 기회-유진 ☞[포토]SKT "동자승과 함께하는 미래기술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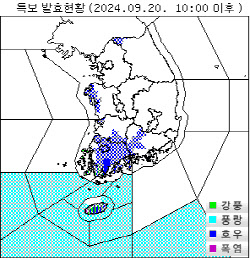




![[포토]홍예은,즐거운 쌍브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129t.jpg)
![[포토]주얼리를 향한 고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751t.jpg)
![[포토]수시 전형 상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732t.jpg)
![[포토] 행정안전부, 호우 대책 중대본 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674t.jpg)
![[포토] '아프려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605t.jpg)
![[포토] 취재진에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538t.jpg)
![[포토]애플 아이폰16 1차 출시국, 기다리는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450t.jpg)
![[포토]고소장 접수위해 중앙지검 민원실 향하는 검은우산비대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883t.jpg)
![[포토]신자용 대검차장과 인사 나누는 심우정 검찰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611t.jpg)
![[포토]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1900534t.jpg)

![[포토]홍예은,출발합니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9/PS2409200013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