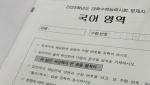|
교육문제 때문에 교외에 사는 바버라는 늘 교통체증 속에 출근을 한다. 야근을 자청하는 회사 분위기에 칼퇴근 운운하는 건 `나를 잘라주세요`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여가? 그런 게 뭔지도 모른다. 반면 이사벨은 승용차가 필요없는 대중교통 천국에 살고 있다. 퇴근 이후에 회사에 남는 건 상상도 해본 일이 없다. 보육비는 공짜인 데다 매년 주어지는 6주간 휴가를 어떻게 쓸지가 늘 고민이다.
이 차이는 왜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서두인 동시에 결말이다. 열쇠는 `복지`다. 책은 미국과는 생판 다른 독일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다. 미국 한 변호사가 독일에서 체험한 복지현장을 생생히 훑는다. 바버라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던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유럽보다 훨씬 높은 미국인의 삶의 질이 왜 이 정도밖에 안되냐는 거다.
분석에 들어갔다. 유럽, 특히 독일이 미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노동자의 권리였다. 노사제도·고용·연금 등에서 독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누리고 산다. 소비자로서의 지위도 다르다. 교육·의료·공공시설 등에서 독일인은 미국인보다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제공받는다. 소비자로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세금 때문이란 진단도 꺼내봤다. 그러나 미국의 세금이 턱없이 적은 것도 아니다. 유럽의 80%에 달한다.
|
먹고 살만한 나라들의 고민은 결국 복지로 귀결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 줄 진작 알고 있었지만, `선성장 후복지` 논리 위에 정리해고가 일상인 한국의 현실에 책이 던지는 파장은 크다. 미국 것이라면 앞장서서 좇고 있는 한국도 미국이 생각을 바꾸면 달라지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 관련기사 ◀
☞직원만 바꿔라? 리더십부터 바꿔라
☞[새 책]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 외
☞[클립_한국여행] 사계절, 전라도 외











![[포토]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0713t.jpg)
![[포토] 2025학년도 수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400625t.jpg)
![[포토]벼랑 끝에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728t.jpg)
![[포토]유상임 과기정토부 장관, 통신사 CEO 간담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573t.jpg)
![[포토]수능 D-1, 힘내라 고3!](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501t.jpg)
![[포토]서울시·의료계,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협약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459t.jpg)
![[포토]'악수하는 주호영-추경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245t.jpg)
![[포토]태광그룹 노동조합협의회, '김기유 구속하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22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1/PS24111301017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