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전세계 경제가 동시에 휘청거리자 위기 해소에 나설 주체는 정부 밖에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밝힌 "우리는 이제 모두 케인지언(Keynesian; 케인즈 이론 추종자들)이다"라는 말이 또 한 번 공명했다.
2009년 9월 현재 1년 전 이같은 처방전은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올만 하다. 미국을 비롯, 전세계 경제가 깊은 심연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아직 완치되지 않은 경제를 위해 처방을 바꿔야 할 시점을 놓치면 안된다는 것. 상황에 따라 약(藥)은 곧 독(毒)일 수도 있다.
◇ 돌고 돌아 다시 온 케인즈
1929~1933년 재임한 허버트 후버 당시 미 대통령은 당시 불붙어 절정을 이룬 대공황에 대해 `저절로 진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고집했지만 불안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선택은 정권 교체였다.
|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고용을 늘림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는 처방전을 쓴다. 시장에 맡겼던 자본주의가 정부 손에 넘어왔다. `투자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Investment)`라 칭하며 이렇게 `큰 정부`를 옹호했던 이가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였다.
1940년대 이후 수 십년간 세계는 번영을 누렸고 케인즈 이론은 만병통치약처럼 군림했지만 이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이 줄기 시작했으며, 사회보장 지출을 크게 늘렸던 정부도 숨이 차기 시작했다. 케인즈가 설명할 수 없는 불황 속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나고 말았다.
이에따라 정부의 역할에 테두리를 둘러야 한다는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가 태동했다. 그러나 규제 철폐는 결국 무리한 수익 추구를 불렀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리스크가 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인과론에 따르자면 다시 죽은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다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은 위기 진화를 위해 전체 경제 규모의 5.5%에 해당하는 7870억달러를 2년간 풀기로 했다. 그리고 공공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제2의 뉴딜을 내놨다.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정부도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곳간을 풀기로 결정했다.
|
1년 후인 지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제조업 지표가 호전됐다. 더 이상 정부의 `도움닫기` 없이 민간 수요에 의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란 점에서 중요하다. (관련기사 ☞ `전세계 공장이 돈다` 민간수요가 회복 이끌까)
사회주의 국가여서 `케인즈식`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중국 역시 강력한 부양책으로 성장의 기세를 놓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다. 중국은 4조위안에 이르는 부양 자금을 쏟아 부었고, 이에따라 올해 정부 목표치(8%)를 넘는 9%대의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부양책 부작용과 회의론도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낸 것은 부양책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경우 정부 지출보다는 오히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금융권 살리기 정책 등이 효과를 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소개했다.
인플레이션도 걱정거리. 이미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지난 달 물가가 치솟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섰다.
늘어난 재정적자는 지금은 미루더라도 결국은 해소해야만 하는 숙제다. 이는 세금 인상을 부를 공산이 크고, 결국 가뜩이나 부양되지 않고 있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유럽은 사실 이같은 이유로 처음엔 미국의 행보를 마뜩찮아 했다. 결국은 대세를 따를 수 밖에 없었지만 말이다.
|
페어 스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는 영국의 재정확장 정책을 두고 "아둔한 케인즈주의`란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독일은 유럽 가운데에서도 가장 재정 확장에 수비적이었다.
▶ 관련기사 ◀
☞(Post Crisis)①금융판을 엎은 `악마의 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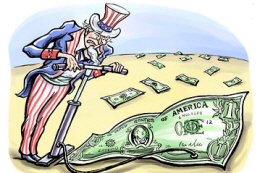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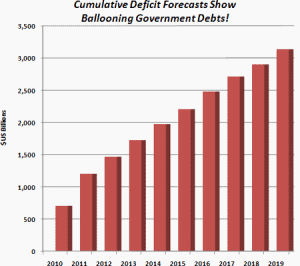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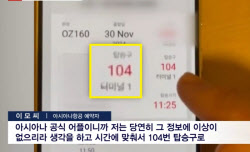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포토]비상의원총회, '대화하는 추경호-조정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84t.jpg)
![[포토]최상목 "野 감액안 허술한 예산…무책임 단독 처리 깊은 유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344t.jpg)


![[단독]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銀 ‘자율규제’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201074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