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1997년 구조조정을 단행한지 10년째를 맞이한다. 1995년 반도체 호황에 만끽한 뒤 IMF사태를 맞이한 삼성전자는 당시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제2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2004년 이후 3년간의 호황국면이 끝나자 삼성전자가 조직의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업황 하락기에 호황을 대비해 신발끈을 다시 묶겠다는 경영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 삼성전자 환란 구조조정 이후 고속성장에 직원수도 2배 늘어나
삼성전자는 1997년말 외환위기 직전인 5월부터 수원 사업장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무수익 부실자산을 1조원 넘게 매각했고, 120여개가 넘는 사업과 제품을 매각, 철수, 분사했다.
1997년말 13조원이던 차입금이 1999년 6조원으로 줄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구조조정과 혁신의 효과를 톡톡히 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구가했다.
1999년 26조원대 였던 매출은 2003년 43조원대로 확대됐다. 2006년에 외형이 58조7727억원에 달하며 60조원대를 넘보고 있다.
|
◇ 외형성장 정체되고, 수익성은 '우하향'..다시 고삐 죄나
그러나 '파죽지세' 같던 성장세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이다. 2004년 이후 업황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3년 연속 50조원대를 넘어섰지만, 외형은 57조~58조원 수준에서 제자리를 걸었다. 영업이익도 2004년 12조원을 정점으로 하락, 2006년엔 6조원대로 떨어졌다.
|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는 외형이 정체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흑자를 내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 역시 건재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거 90년대 후반처럼 호황을 누리다보니 조직의 긴장도가 떨어진 것 같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하반기 대졸 공채인원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추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인력을 뽑아왔지만, 올해는 회사의 경쟁력를 위해 적정 인력만 선발하기로 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행보가 어느때보다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소니·인피니온, 반도체 합작사 설립.."삼성 나와"
☞코스피 "실적 업고 2000p 간다"..증권주 질주
☞윤종용 부회장 "구글같은 창조적 서비스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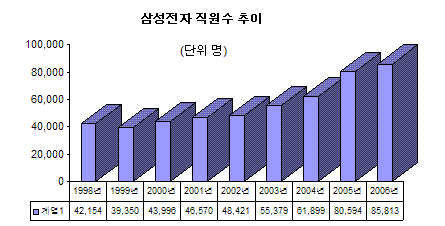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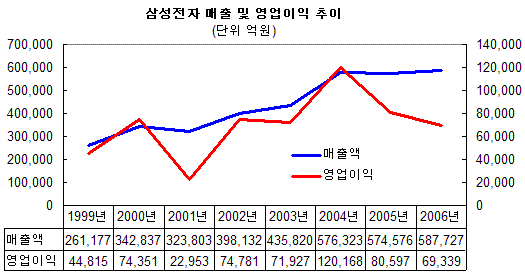






![[포토]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지역주민위한 공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127t.jpg)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포토] 대통령실 입구의 취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817t.jpg)
![[포토]'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571t.jpg)
![[포토]'긴박했던 흔적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485t.jpg)
![[포토]조국, '국가 비상사태 만든 이는 尹...탄핵해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366t.jpg)
![[포토]尹, '비상 계엄 해제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27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