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경제개혁연대의 감리요청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28일 최종 통보했다. 관련기사☞금감원, GS건설 분식회계 의혹 조사 안한다
그동안 정황은 이렇다. GS건설은 지난 2월 기업설명회에서 올 1분기 영업이익이 2000억~3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영업손실만 5354억원에 달했다. 불과 두 달 새 7000억~8000억원이 오락가락한 셈이다. 당시 회사 측의 말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거 손실을 봤고, GS건설을 추천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서 GS건설에 대해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이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해 회계처리를 하는 까닭에 갑작스러운 변수로 예상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손실도 불어난다.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인 경우 예상 비용을 의도적으로 줄여 당장의 이익을 부풀릴 수도 있다.
GS건설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난 것도 같은 원리다. 해외 하도급업체가 갑자기 부도를 내거나 발주처와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 예상 밖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GS건설 측은 지난 3월 한달 간 공사현장 전수조사릍 통해 원가율을 다시 계산해 대규모 손실 사실을 시장에 미리 알린 것 자체가 오히려 칭찬 받을만한 일이라고 자평한다.
바꿔 말하면 GS건설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도 언제든 예상을 뒤엎는 대규모 손실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개별 사업장에 대해선 예상 손실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건설사가 사업장 전수조사를 자주 실시하도록 강제할 순 있지만 전수기간 중 공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쉽지 않다. 결국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엔 건설주 투자에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뒷통수를 맞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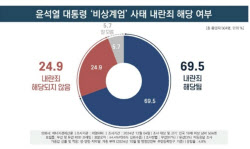




![[포토]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534t.jpg)
![[포토]서울 지하철, '계엄 파문 속' 3년 연속 파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82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79t.jpg)
![[포토]최고위, '모두발언하는 한동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500432t.jpg)
![[포토]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지역주민위한 공연](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127t.jpg)
![[포토]국회 월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332t.jpg)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국민 10명 중 7명 尹 탄핵 찬성…부산·대구에서도 60% 이상[리얼미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500353h.jpg)
![한은 "계엄사태 시장 영향은 제한적…연간성장률 달성 가능할 듯"[일문일답]](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4/12/PS2412050052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