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이후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에서 ‘최초’라는 단어를 항상 달고 다녔다. 한미약품은 2004년 당시 국내에서만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노바스크는 ‘암로디핀’이라는 주 성분에 ‘베실산’이라는 보조 성분이 붙어있다. 한미약품은 이 ‘베실산’을 ‘캄실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특허를 회피, 제네릭보다 시장에 먼저 진출했다. 암로디핀은 연간 500억원대 매출을 가져왔고 당시 국내 제약사중 매출 5위권 밖에 있던 한미약품을 매출 2위까지 끌어올렸다.
|
한미약품은 2013년 최초의 고혈압약·고지혈증약 복합제 ‘로벨리토’를 개발하며 복합제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다양한 제형을 개발하면서 한미약품의 합성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일찌감치 글로벌 업체와 손잡은 것도 해외시장 동향을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 한미약품은 로벨리토를 개발하면서 사노피와 손잡았다.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도 복합제 개발을 시도한 적도 있다. 아모잘탄은 미국 머크와 국내에서 공동으로 판매했다. 머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아모잘탄은 국산 개량신약 최초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R&D 자금을 마련해준 영업에서도 한미약품은 늘 다른 제약사를 앞서 나갔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되자 약국에서는 더이상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제약사들이 새로운 영업방식을 고민할 당시 한미약품은 집중적으로 의원급 시장을 공략하면서 매출 급성장세를 이뤄냈다. 이후에도 한미약품은 시장 환경이 변할 때마다 영업전략을 개편하면서 종합병원, 의원급, 약국 시장을 절묘하게 공략했다.
이관순 대표는 “신약도 너무 다양한 분야를 시도하기 보다는 시장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한미약품의 집념은 총 6조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완성했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짧은 반감기를 늘려주는 플랫폼 기술로 투여 횟수 및 투여량을 감소시켜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개선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신약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의약품에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면서 글로벌제약사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냈다.
사노피와 얀센 모두 기존 시장을 방어할 만한 새로운 당뇨치료제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자 앞다퉈 계약을 추진했고 계약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다.
▶ 관련기사 ◀
☞ 국산신약 해외진출 잔혹사
☞ '연구 실패하면 반성문'..신약개발 가로막는 경직된 조직문화
☞ '수출 대박' 한미약품, '복제왕국'에 성공DNA 제시하다
☞ 국산신약 1세대 '절반의 성공'..'제2의 한미약품' 곳곳에 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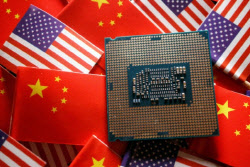





![[포토]'모두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359t.jpg)

![[포토]의정갈등에 피해는 환자에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64t.jpg)
![[포토]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 목표액 4497억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76t.jpg)
![[포토] 서울 중장년 동행일자리 브랜드 선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708t.jpg)
![[포토]'본회의장 향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677t.jpg)
![[포토]표정 어두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 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59t.jpg)
![[포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발표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32t.jpg)
![[포토]교보생명 광화문글판, 유희경 시인 ‘대화’로 새단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500t.jpg)
![[포토]우정사업본부, 2025 연하우표 발행](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20043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