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상호출자제한집단)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순환출자 형태를 유지하는 곳은 삼성,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13곳이다. SK가 소버린의 공격을 방어해낸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했듯이, 엘리엇 사태를 계기로 다른 대기업들도 향후 어떤식으로든 대대적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최근 증권가를 중심으로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낮은 대주주 지분과 이를 보완해주는 복잡한 순환출자, 3~4세로 지분승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4세들은 계열사 지원을 받는 비상장회사로 기반을 확보한 뒤 출자구조의 핵심고리에 진입,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림을 그려왔다. 이건희 회장 입원 이후 삼성이 제일모직이라는 ‘대어’를 빠르게 상장시킨 것도, 상장 6개월만에 삼성물산과 합병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이었다.
애초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1996년 전환사채로 지분을 확보한 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상태에서 20여년간 구조 개편을 진행해왔음에도 엘리엇에게 가장 결정적 움직임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라는 고리를 포착당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최대주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장남 정기선 상무로 지분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구조개편은 아직 첫 문항도 풀지못한 숙제다.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현대차보다 낮지만 최대주주의 정치적 지위를 감안하면 어느 그룹보다 승계문제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진과 한화도 최근 순환출자구도 문제를 대부분 해소했지만, 지분 승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한화S&C와 같은 창업주 3세들이 보유한 비상장자회사가 언제 구조개편 과정에 전면 등장할지가 관심인데, 계열사 지원으로 성장해온 이들 기업을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야하는 과제가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엘리엇 사태는 이번 한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국내 대기업에 시한폭탄처럼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국계자금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주주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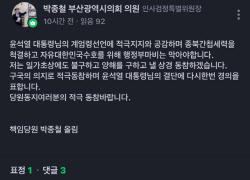




![[포토]'규탄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162t.jpg)
![[포토]비상계엄 해제 후 한자리에 모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1092t.jpg)
![[포토]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두운 표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960t.jpg)
![[포토]청사들어서는 한덕수 총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786t.jpg)
![[포토] 대통령실 입구의 취재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817t.jpg)
![[포토]'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571t.jpg)
![[포토]'긴박했던 흔적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485t.jpg)
![[포토]조국, '국가 비상사태 만든 이는 尹...탄핵해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366t.jpg)
![[포토]尹, '비상 계엄 해제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400277t.jpg)
![[포토]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12/PS24120300908t.jpg)




